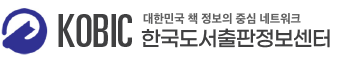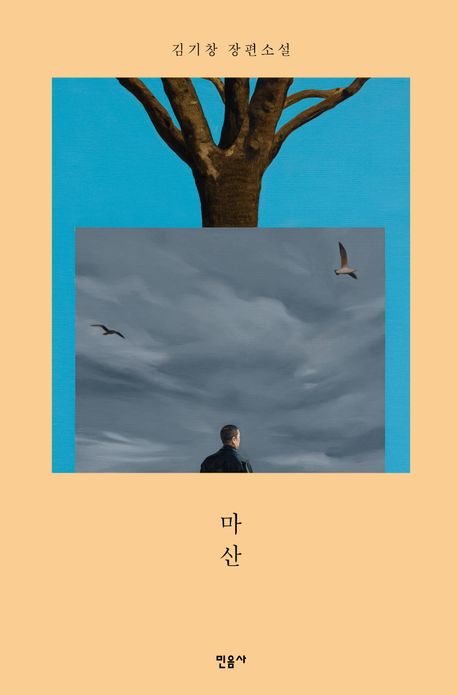전체 분야
도서분류
문학 > 한국소설 > 한국소설일반
도서소개
1974년의 동미, “공장은 밤이 낮처럼 환한 세계였다.”
1999년의 준구, “사라진 부모님을 그게 대신할 수 있다고? 대마초가?”
2021년의 은재와 태웅, “적어도 서울은 그럴 기회가 적당히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마산은 아니었다.”
소설가 김기창의 신작 장편소설 『마산』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2014년 제38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한 장편소설 『모나코』를 시작으로 김기창은 『방콕』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등의 작품을 통해 도시와 환경이라는 공간이 그 안의 인물들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과 그 안에 속한 인물들의 치열한 분투를 끈질기게 그려 왔다. 이번 소설의 배경이 된 마산은 3·15 의거와 19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 분기점을 함께 호흡해 온 도시다. 마산이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만큼, 장편소설 『마산』에 담긴 50년 즉, 1970년대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세 세대에 걸친 인물들의 서로 닮은 삶과 슬픔은 작가가 그동안 천착해 온 ‘공간’이라는 주제가 가장 핍진하고도 처절하게 그려진 하나의 정수가 되었다. “시간이 땅과 마을, 국가와 세계를 재료로 빚어내는 변화와 그 안에서의 인간의 운명을 쓰는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진지한 자세를 취할 때 수행한 최고의 본업 같은 것”이라는 천정환 교수의 말처럼, 『마산』은 대한민국이라는 땅, 마산이라는 도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얽히고설킨 운명을 마주한 인물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낸, 살아 움직이는 작품이다. 지금 『마산』을 읽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속한 공간의 명과 암을 이해하고 그 이해로부터 미래로 신중한 발걸음을 떼는 일이 될 것이다.
추천사
천현우 (『쇳밥일지』 저자)
소설이 묘사하듯 마산은 주민들한테 살가웠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듯 잘해 준 거 하나 없는 도시에 사람들은 왜 자부심을 느낄까. 『마산』은 구저분한 내 고향의 과거와, 끝없이 쇠락해 가는 현재를 담담히 비추는 자화상이다. 이 소설의 아름다움은 바다도 도시도 아닌,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아 내는 등장인물의 삶 속에 녹아 있다.
저자소개
저자 김기창
경남 마산 출신으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장편소설 『모나코』 『방콕』,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크리스마스이브의 방문객』 등을 썼다. 2014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의 방문객(양장본 Hardcover)
숨 쉬는 소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반양장)
방콕(양장본 Hardcover)
모나코(2014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양장본 Hardcover)
목차
프롤로그 7
1부 가고픈 도시 19
2부 술과 꽃의 도시 117
3부 불타는 도시 283
에필로그 377
작가의 말 383
발문(천정환) 387
추천사(천현우) 397
서평
소설이 묘사하듯 마산은 주민들한테 살가웠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듯 잘해 준 거 하나 없는 도시에 사람들은 왜 자부심을 느낄까.
-천현우(『쇳밥일지』 저자)
● 마산으로, 마산으로
마산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산업적으로 큰 분기점을 맞을 때마다 파도를 온몸으로 맞이하고는 그 상흔을 곳곳에 품게 된 도시다. 먼저 1970년대, 섬유 산업의 흥성으로 도시도 함께 부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억압적인 노동 환경을 견뎌 내야 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섬유 산업의 쇠퇴는 물론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각자 짊어져야만 했던 청춘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 관광 산업으로 다시금 도약을 도모해 보던 도시가 팬데믹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며 함께 막막한 미래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들이 있었다. 소설가 김기창의 장편소설 『마산』은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로지르며 쓸쓸하고 스산한 도시를 거니는 세 세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 냈다. 1974년의 동미, 1999년의 준구, 2021년의 은재와 태웅. 세대는 다르지만 이들이 느끼는 절망과 고독은 슬플 만큼 닮아 있다. 『마산』은 묻는다. 이토록 척박한 각자도생의 삶에 과연 탈출구가 있을지. 이곳 마산에서 각자의 희망을 다시 피워 낼 수 있을 것인지.
▶ 1974년의 동미, “공장은 밤이 낮처럼 환한 세계였다.”
‘마산으로, 마산으로’라는 말이 나돌던 시절, 취업을 위해 마산에 온 동미는 마산에 설립된,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에 다니며 일본행을 꿈꾸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타이밍’이라는 각성제를 발급받아 밤낮없는 노동을 강요받는다. 일본행만을 위해 현실을 버텨 오던 동미는 경리과장에게 속아, 일본인 지사장 겐지와의 주말 등산에 동행한 일이 공장 내 스캔들로 번지며 일본행마저 좌절되고 만다. 동미는 결국 밤이 낮처럼 환한 공장을 뛰쳐나오며,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어둠 속으로 달려 들어간다.
▶ 1999년의 준구, “사라진 부모님을 그게 대신할 수 있다고? 대마초가?”
준구의 부모는 IMF의 여파로 중국으로, 브라질로, 거듭되는 좌절에 뒤쫓기며 새로운 삶을 향해 도피 중이다. 마산에 홀로 남은 준구는 당장 내일의 생계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준구는 이제는 폐허가 된 부모님의 상점 ‘광남유니폼사’에 목돈을 숨겨 두었다는 아버지의 전언에 따라 빚쟁이들의 시선을 주의하며 몰래 어둑한 가게 안으로 잠입한다. 그러나 가게 안에는 뜻밖의 손님이 먼저 와 있었다. 광남유니폼사 직원이었던 명길이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절망을 전하며 명길과 준구는 먼지가 뒹구는 불 꺼진 상점 안에서 한동안 대치한다. 앞으로 더 짙은 어둠이 자신들에게 덮쳐 올 것을 예감하면서.
▶ 2021년의 은재와 태웅, “적어도 서울은 그럴 기회가 적당히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마산은 아니었다.”
플라스틱 제조 업체에서 일하던 태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마산에서라면 대마초 장사가 잘되리라는 것. 마침 태웅의 대학 동창 은재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허름한 호텔방 한켠에서 꽃씨처럼 보이는 뭉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대마초 씨앗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린다. 선을 넘지 않고서는 지리멸렬한 인생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한 둘은 위험한 길로 들어서기로, 선을 넘어 버리기로 결심한다. 넘어야 할 선은 자꾸만 뒤로 물러나며 둘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하지만 은재와 태웅은 물러서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것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