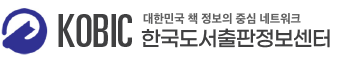전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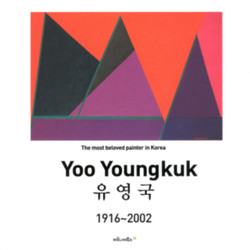
도서분류
예술 > 미술 > 회화 > 국내화집
도서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예술/대중문화 > 미술 > 회화 > 국내화집
이 책의 설명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 유영국의 작품 세계
추상적 형상과 색면의 구성, 유영국의 작품 세계『유영국 Yoo Young Kuk』.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 유영국의 작품과 미술사학자 및 평론가들이 유영국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해설한 것을 모은 책이다. 유영국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구성의 밀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의 성실한 작업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 일관된 자기 세계의 완성을 향한 치열한 정신의 불꽃을 피운 작가 유영국. 그의 작품을 만남으로써 자기 완성으로 향하는 조형을 통한 한 구도자의 정신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유영국
목차
Principle of Sublimity
Chung Byungkwan│Art Historian
숭고의 원리
정병관│미술사학자
Abstract Shape and Color Field Composition:
The Art World of Yoo Young Kuk
Oh Gwangsu│Art Critic
추상적 형상과 색면의 구성: 유영국의 작품 세계
오광수│미술평론가
The Mountain of Yoo YoungKuk:
'Moral Landscape'
Chung Youngmok│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유영국의 산: '도덕적 풍경'
정영목│서울대학교 교수
'Rhapsody' of Spirit of Freedom and Nature
Lee Inbum│Professor, Sangmyung Uniwersity
자유 정신과 자연을 향한 '랩소디'
이인범│상명대학교 교수
Biography
작가 약력
List of Works
작품 목록
서평
한국 최초의 추상미술가 유영국 숭고의 원리
유영국의 산 그림들은 ‘인자요산(仁者樂山)’을 상기시킨다. 그는 시골집을 매일 왕복하면서 푸른 치악산을 보았고, 고향 울진에서도 동에는 바다가 서에는 산이 보였다. 그의 그림은 봄의 연두빛, 여름의 초록빛, 가을의 주황 또는 붉은빛, 겨울의 짙은 청색 등을 연상시킨다. 순수 추상의 시기에도 청정공기와 높은 기상, 명상과 서정이 있다. 이런 그의 그림에 숭고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것 같다.
프랑스 추상에는 숭고라는 가치가 없다. 마티에르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앞서 말한 니콜라 드 스탈의 색면추상과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s, 1919~)의 검은 색면추상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숭고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아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것뿐이다. 확실한 것은 미(美)라는 가치가 추락하여 예술이 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관념이 확대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예술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시대가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뉴욕의 색면추상 화가들이 피에르 보나르(Pierre Bonnard, 1867~1947)의 뉴욕 전시를 보고 그 풍부한 색채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고, 근년에 누군가가 「The New Yorker」라는 문학 잡지에 썼다. 뉴욕 색면추상파가 추상미술의 선구자들이 아니라 구상 화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내 생각에는 유영국은 피에르 보나르보다는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색채화에 더 접근성이 있어 보인다. 유영국 그림의 숭고성도 윌리엄 터너의 극적인 그림이 아니라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의 정적인 그림에서 받는 느낌과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여기에서 ‘숭고’라는 주제에 매달린 것은 「중용의 원리」라는 글에서 유영국 그림을 분석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미술사학자 정병관
추상적 형상과 색면의 구성: 유영국의 작품 세계
우리 미술에 있어 추상미술은 1930년대 후반 일본 자유미술가협회를 통해 등단한 두 사람의 작가에 의해 출발되었다. 김환기(1913~1974)와 유영국(1916~2002)이 그들이다. 김환기가 비구상계열인 반면 유영국은 추상계열이었다. 비구상은 자연에서 출발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상의 과정에 도달하는 경향이고 추상은 기본적인 조형적 요소 즉 삼각, 사각, 원과 같은 도형으로 처음부터 구성에 임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유영국은
(1938),
(1939),
(1940)이 한결같이 순수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일관된다. 앞선 1938년, 39년의 작품이 합판 부조의, 당시로서는 가장 실험적인 경향의 작품이란 점에서 추상미술 가운데서 가장 실험적인 작품을 구현해준 것이었다.
유영국의 작가로서의 출발은 일본 문화학원 시절인 1937년에 《독립미술가협회전》과 《자유미술가협회전》에 각각 입선하면서부터이다. 1943년에 귀국하기까지 약 6년간의 동경시대는 《자유전》에서의 최고상(1938)과 회우로서 영입되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이 백여 점을 상회한다는 사실에서도 그의 의욕적인 창작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많은 평자들이 유영국의 작품을 원숙 내지 완성의 경지로 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그의 작업의 열기와 상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7평 남짓한 좁은 화실에서 하루 10시간씩 틀어박혀 제작에 매진했다는 것은 좀처럼 그 예를 찾아볼 수 없게 한다. 창작에의 집념, 치열한 자기와의 대결, 조형을 통한 정신 세계의 구현이라는 구도자적 자세는 진실로 거장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유영국만큼 일관된 자기 세계의 완성을 향한 치열한 정신의 불꽃을 피운 작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의 화면 앞에서 만나는 긴장감은 자기 완성에로 향하는 조형을 통한 한 구도자의 정신의 희열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술평론가 오광수
언론보도 -유영국 10주기 기념전-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 유영국(劉永國·1916~ 2002).
1940년대 말 유영국은 일본 유학시절 배운 추상화를 우리 화단에 소개해 동료·후배들에게 큰 자극을 줬다. 강렬한 색채의 기하학적 추상은 당시 미술계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림이었다. 1948년엔 김환기 등과 함께 '신사실파(新寫實派)'를 결성하고, 1950년엔 반(反)국전(國展) 운동인 '50년 미술협회'를 결성하는 등 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유영국의 또 다른 별칭은 '산(山)의 화가'. 고향 뒷산에 대한 향수를 담은 '산'은 엄격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일관하던 초기 작품이나, 구획선이 도드라지는 후기 작품 모두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다. 전시에서는 주황·빨강·암적색으로 삼각형 산의 형태를 그린 절필작(1999)을 비롯해 다양한 산 그림을 만날 수 있다. 1937년 '독립미술가협회전'에 처음 작품을 낸 이후 60여년간 꼬박 추상에 매달려 온 이 작가는 1996년 이런 글을 남겼다. "현재 나에게는 노인으로서 노년의 흥분이 좀 더 필요하다. 요즈음 내가 그림 앞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배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할 것이다."
-조선일보 2012. 5. 14
절제된 선·면·색채…흐트러짐없는‘한국의 山’
자고로 예술가들은 낭만을 좇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이 나은 모더니스트 유영국(1916~2002)은 달랐다. 그는 마치 공장노동자처럼 일했다. 함께 추상미술운동을 펼쳤던 세 살 연상의 김환기, 노장적 풍모를 지녔던 중학동창 장욱진, 순진무구한 사랑을 노래했던 이중섭과는 삶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것. 그에겐 낭만적 신화나 기이한 인생스토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대신 프로페셔널한 작가로서 치열하게 작업에 임했고, 그 결과 ‘한국 추상미술의 기수’로 우뚝 섰다. 그의 10주기를 맞아 특별전이 열린다. -헤럴드경제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