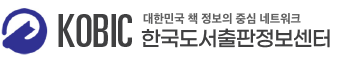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저자 :
발행일 : 2013년 10월 21일 출간
분류 : 인문학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KDC : 사회과학(390)
정가 : 18,000원
도서분류
인문학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인문학 > 문헌정보학 > 고문서
인문학 > 문헌정보학 > 고문서
수상 및 추천도서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13년 10월 3주 선정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동아일보 > 2013년 10월 3주 선정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서울신문 > 2013년 10월 3주 선정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조선일보 > 2013년 10월 3주 선정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13년 11월 4주 선정
도서소개
쓰레기 고서 더미에서 건져올린 옛사람들의 삶과 인문학의 길!
한 인문학자의 섭치 정탐기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2009년 가을부터 2013년 가을까지 계간 《문헌과해석》에 연재한 글을 엮은 책으로, 우연한 기회에 ‘쓰레기 고서’를 잔뜩 얻게 된 저자는 희귀한 고서는 들려주지 못하는, 이런 책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체 15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장마다 책 한 권의 입수경로를 비롯하여 오늘날과 다른 고서의 권과 책의 개념, 고서의 체제와 제작과정, 필사와 목판본, 방각본 등의 차이를 소상하게 일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 고서’에서 의미를 띤 ‘역사적 발화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고서들에 대하여 ‘해제·개요’ 이상의 내러티브를 허락하지 않았던 기존 학계의 흐름과는 달리, 이 책은 내용 소개를 넘어 고서를 통해 현실의 ‘실존적’ 질문을 계속 던진다. 과거 책의 주인이 간직했던 눈부신 꿈,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명의 저자가 지어내야 했던 서문의 기기묘묘한 이야기, 출판된 종이의 뒷면에 필사해 내려간 책 등으로부터 반성과 사유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이다.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장유승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공저),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일일공부』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정조어찰첩』, 『영조 승정원일기』 등이 있다.
후재집 2(양장본 Hardcover)
후재집 3(양장본 Hardcover)
열성어제와 국왕의 문학
고전과 동아시아
아무나 볼 수 없는 책
콘텐츠
만정당집 4(양장본 Hardcover)
만정당집 5(양장본 Hardcover)
문정공유고 2(양장본 Hardcover)
만정당집 3(양장본 Hardcover)
목차
들어가며
1장|손안의 백과사전 - 《백미고사白眉故事》
책을 만드는 방법 | 간략하면서도 충실한 고사성어 모음집 | 손안의 백과사전
2장|명당을 찾아서 - 《옥룡자답산가玉龍子踏山歌》
복거卜居와 택일擇日 | 풍수지리와 명당 | 꿈보다 해몽
3장|경매장에서 건진 보물 - 《소화아집小華雅集》
고서를 경매한다? | 경매장 풍경 | 시에 얽힌 이야기, 시화詩話 | 파란만장한 현대사와 고서의 운명
4장|시詩의 시대 - 《시전대전詩傳大全》
시를 읽습니까? | 3000년 전의 시집 | 저물어가는 시의 시대 | 시를 위한 변명
5장|손수 만든 시집 - 《과시科詩》
「평생도」에 그린 일생 | 시와 일생 | 손수 만든 시집 | 인생은 일상의 집합
6장|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 《척독요람尺牘要覽》
편지의 본질 | 편지 쓰는 방법 | 편지를 전하는 방법 | 왜 편지를 쓰는가 | 마지막 편지
서평
세월의 때와 천대를 견디고 살아남은 고서古書들
박물관과 고서점에서조차 내팽겨쳐진 섭치들
쓰레기 고서 더미에서 건져올린 열다섯 권의 책을 통해 옛사람들의 삶을 읽고 인문학의 길을 찾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서가 항균 방습 시설을 갖춘 도서관 귀중본 고서실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고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희귀한 고서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쓰레기 고서는 지금도 찢기고, 불타고,
썩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단지 쓰레기
고서들에게 조금 나은 대접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쓰레기 고서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도 저는 쓰레기 고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변변치 않은 존재로 취급받다가 아무에게도 눈길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_ 들어가며
1. 출간의의
젊은 한문학자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섭치 고서들’의 세계를 종횡무진 탐방한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 한 인문학자의 섭치 정탐기》가 출간되었다. 섭치는 순우리말로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변변하지 아니하고 너절한 것”을 말하며 ‘TV쇼 진품명품’에 들고 가면 방송관계자가 입구에서 돌려보낼 만큼 흔하고 ‘싼티’ 나는 고서들을 말한다. “섭치는 세월이 지나도 섭치”(박대헌, 《고서 이야기》, 열화당, 2008)라는 말을 듣고, 지공예紙工藝 하는 분들이 재료로 활용되는 책. 연대가 올라가봤자 고작 100년이고, 독자적인 문헌적 가치도 없어 도서관·박물관, 심지어 고서점에도 진열되지 못하는 ‘안구에 습기가 차는’ 고서적 뭉치들을 그 가혹한 집단 호칭에서 해방시켜 하나하나 분류하고 새롭게 그 역사적·인류학적·독서사회학적 가치를 매긴 작업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강조한다. “왜 쓰레기 고서가 중요한가?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이다. 거기엔 분명 우리에게 들려줄 말이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책들의 이름을 보자. 《백미고사白眉故事》는 조선시대 유통되던 유서類書류를 누군가가 간추려 엮은 책이다. 왜? 글을 지을 때 인용할만한 고사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으면 편하기 때문이다. 《옥룡자답산가玉龍子踏山歌》는 풍수책이다. 그런데 저자가 그 유명한 신라의 도선국사道詵國師(827∼898)이고 이 책의 주인은 자기가 금강산을 유람할 때 홀연히 나타난 노인에게 이 책을 전해받은 것이라고 서문에 쓰고 있다. 이는 모두 책의 가치를 높이고 주장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당시에 흔하게 써먹던 수법이다. 《소화아집小華雅集》은 저자의 친구가 고서 경매장에서 구한 책으로 시와 문인들의 역사적 일화를 모은 책이다. 그 자체론 특별할 게 없지만 이 책의 원 소장자가 월북하다가 실종된 당시 서울대 교수 이명선이라는 데서 이 책은 특별한 역사적 숨결을 담은 빛깔을 반짝이기 시작한다. 《과시科詩》는 과거시험에 나오는 시들의 기출문제집인데, 그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는 데서 놀라움을 자아내며 《척독요람尺牘要覽》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하는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다.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은 로맨스 소설이고 《의학입문醫學入門》은 가정용 의학백과사전이다. 그런가 하면 쓰레기 고서더미엔 《통감절요通鑑節要》 《대학大學》 《사서오경四書五經》 《서전대전書傳大全》(《서경》 해설서) 등 유명한 고전들도 있다. 물론 나름의 사연을 간직한 대중을 위한 포켓북에 가까운 책들이다. 이런 책들은 원전 그대로 책으로 묶은 게 아니라 소장자의 눈높이나 요구에 맞게 가감이 이뤄지고 목차가 변경되기도 했으며, 책의 앞뒤 표지와 갈피갈피에는 저간의 사정을 보여주는 메모들이 가득하다. 이 책은 이렇게 고서더미에서 당시 사회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15종의 책을 선정해 그들에게 자신만의 히스토리를 자술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다.
특히 저자는 머위대 껍질을 벗기듯 고서에 내려앉은 묵은 때를 벗겨내서 책의 주인이 간직했던 휘황찬란한 꿈,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름 없는 저자가 지어내야 했던 서문의 기기묘묘한 이야기, 사람들 손을 타며 우측 하단의 침 묻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미 출판된 종이의 뒷면에 필사해내려간 책들의 운명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다른 고서古書의 권과 책의 개념, 고서의 체제와 제작과정, 필사와 목판본, 방각본 등의 차이를 소상하게 일러줘 ‘고서 오디세이’를 펼친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고서들에 대하여 ‘해제·개요’ 이상의 내러티브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책은 내용 소개를 넘어 ‘고서 연구자’가 고서의 콘텍스트가 풀려나오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현실의 ‘실존적’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점에서 음악에 비유하자면 ‘노동요’에서 ‘랩’과 ‘힙합’으로 점핑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를 현재의 호흡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반성과 사유가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고서의 ‘내용’ 소개도 소개지만 책 자체의 ‘물성’과 고유명사로서 ‘the book’의 운명, 책을 만들고 베끼고 빌리고 나누는 인간들의 사연을 탐방한 ‘책에 대한 책’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고서점 거리인 진보초의 서점 앞 행상에서 권당 100엔짜리 문고판을 집에 업어온 경험이 있거나, 헌책방을 쥐 풀방구리 드나들 듯 하며 오래된 잡지나 실용 연애서적 류에 눈을 맞추며 전세대와 전전세대의 낭만과 청춘을 가슴에 담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책의 출간이 더욱 남다를 것이다.
2.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저는 옛사람들이 남긴 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고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서에 대한 저의 지식은 몹시 부족합니다. 고서를 접할 기회야 많지요. 서울대 규장각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처럼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고서 소장 기관에서 소중히 보관하는 고서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임금님이나 보던 책을 만지고 읽어본 덕택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졌지요. 그런데 희귀한 책만 관심 있게 보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쓰레기 고서를 잔뜩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 책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참 동안 이 책들을 들여다보니, 희귀한 고서가 들려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_ 들어가며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은 총 15장으로 이뤄져 있고, 각 장마다 책 한 권의 입수경로,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 고서’에서 의미를 띤 ‘역사적 발화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담고 있다.
1장에서는 다루는 《백미고사》라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분류하여 엮은 사전으로 조선의 선비들에게 전자사전과 같은 존재였다. 180권 70책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사문유취》와는 달리 《백미고사》는 한 손에 들고 볼 정도로 아담하다. 한 책에 100장도 되지 않는데 완질이 다섯 책이라 부담 없이 갖고 다니며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과거시험은 대개 글짓기였다. 제목이 주어지면 그 제목에 걸맞은 글을 지어내야 한다. 그런데 한문 글쓰기는 전고典故를 많이 인용하기 마련이다. 전고라는 것은 옛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단어 혹은 숙어라고나 할까. 고사성어와 비슷한 말이다. 전고는 간략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는 데 적합한 글쓰기 방식입니다. 다만 그 전고가 만들어진 배경을 모르면 글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백미고사》는 바로 이러한 쓰임새를 충족시켜 준 조선 후기의 베스트셀러였던 것이다.
2장에서는 한 수상한 책을 심문하면서 시작한다. 풍수지리에 관한 책이다. 겉모습을 보아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을 정도. 서른 장 정도 되는 종이를 겹쳐놓은 다음 조금 두꺼운 종이로 표지를 만들고 노끈으로 묶어놓았다. 간신히 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며 표지에는 열 장 정도 되는 종이가 별책부록처럼 붙어 있다. 아마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태넣어야 할 내용이 발견되어 이런 식으로 덧붙인 것 같다. 표지에는 ‘옥룡자수신인결玉龍子授神人訣’이라고 쓰여 있다. ‘옥룡자’는 누군가의 호인 듯하고 ‘신인결’은 신령한 사람의 비결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옥룡자라는 사람이 전해준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는 말이다. 그 옆에는 ‘檀紀四二九三年’이라고 쓰여 있는데, 계산해보니 1960년이다. 그리 오래된 책은 아니지만 이것은 책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시기가 1960년이라는 뜻이지 책 내용이 1960년에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책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3장에서 책보다는 ‘고서 경매장’ 풍경이 우리의 눈을 붙든다. 저자는 서울 종로 모처에서 열린 경매장을 찾았다. 어림잡아 60~70명은 되는데 대부분 중년 남성으로, 50~60대가 주를 이룬다. 경매 방식은 이렇다.“출품 번호 76번, 조선시대 《풍양세승?壤世乘》 필사본 1책입니다. 시작가는 10만 원입니다.” 사회자가 출품작을 소개한 뒤 시작가를 부릅니다. 사회자가 시작가를 세 번 부를 때까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유찰된다. “10만, 10만, 10만…… 응찰자가 없으시면 유찰입니다.” 저자가 관찰한 바로는 그날 절반 이상이 유찰되었다. 이날 경매에는 300여 종이 출품되었다. 고서가 대부분이지만, 고문서·그림·도자기도 등장했다. 시작가는 가장 높은 것이 700만, 가장 낮은 것이 10만이었다. 평균 가격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시작가 10만 원짜리가 넉넉잡아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었다. 나중에 들으니, 저자가 갔던 날은 연휴가 끼어서 참여자나 출품작이 적었을뿐더러 낙찰가도 낮은 편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고서 경매가 이뤄졌는데, 저자의 지인이 고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책이 바로 이 장에서 소개하는 《소화아집小華雅集》이다. 이 책은 이명선李明善(1914~?)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가지고 있던 책이다. 이명선은 일제강점기에 국문학을 연구해 경성제국대학 조교수가 되었고, 해방 후에는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조선문학사》를 비롯한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 와중에 월북하다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명선은 국문학 연구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명선은 충북 괴산 출신이다. 어린 시절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그 뒤 이명선은 청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의 이명선은 순수한 문학청년이었는데, 이때의 기록에 ‘공허하고 무미건조한 생활’이라고 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대학생활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무료한 생활에서 탈출할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바로 글쓰기였다. 이명선은 1937년 《매일신보》에서 주최한 역사 이야기 현상 공모에서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종손宗孫’이라는 글로 3등에 입상했다. 이 글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한 편의 소설이라 해도 좋다. 유려한 글 솜씨도 글 솜씨지만, 이 글을 통해 그가 우리 옛이야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명선은 대학 시절부터 직접 들은 옛이야기를 정리해 《이야기》라는 책을 엮었다. 여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설화뿐 아니라 《용재총화》 따위의 시화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도 함께 정리해두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가 직접 수집한 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명선은 소설을 비롯한 각종 고서 수집에 열성을 보였다. 그가 고서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스승이었던 가람 이병기 선생의 영향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명선이 수집한 고서는 상당한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소화아집》도 그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다. 1940년 대학을 졸업한 이명선은 잠시 휘문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이 무렵 결혼도 했는데, 그의 부인과 장모는 훗날 그의 저술과 장서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해방을 맞자 이명선은 경성제국대학 조교수에서 서울대 조교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문학 연구에 매진했다. 뭐니뭐니해도 이명선의 대표 업적은 《조선문학사》다. 《조선문학사》는 철저히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쓰인 책이 당시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문학 연구는 이미 뚜렷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결국 이명선은 1949년 좌익 교수로 낙인찍혀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해 서울이 북측의 통치 하에 들어가자 이명선은 서울대로 복귀한다. 북한의 교육성에서 이명선을 대학 총책임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이명선은 서울에 남아 있던 지식인들에게 인민군에 지원하라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측을 지지했다. 전황이 바뀌어 서울이 수복되자 이명선은 월북을 시도한다. 가족도 책도 서울에 남겨둔 채 홀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후의 행방은 묘연하다. 월북 도중 폭격을 맞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옳은 듯하다. 당시 그의 나이 서른일곱이었다. 이명선의 장모와 부인은 이명선이 월북한 뒤 그의 책을 안암동 자택 방공호에 보관했다. 이명선이 평생에 걸쳐 수집하고 소중히 여겼던 책이었기에 언젠가 돌아와 이 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이명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부인도 세상을 떠났다. 책이란 한곳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리저리 흩어지기는 쉬운 법이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 책은 금세 사라진다. 분실, 도난, 파손, 매매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주인 잃은 책들의 운명이다. 이명선의 장서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갔지만 일부는 고서 시장으로 흘러나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으로 옮겨갔다. 《소화아집》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저에게 왔으니, 참으로 사연 많은 책이다. 여러 시화의 내용을 짜깁기한 《소화아집》은 보잘것없는 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사연을 알고 보면 이 책은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겪은 소중한 보물임에 틀림없다.
3장은 《과시》다. 조선 선비가 한 평생 지은 시는 한 사람당 몇 편쯤 될까? 많이 지은 사람은 수만 편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집에 실려 전하는 것은 평생 지은 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문집에는 수백 편에서 1000편 정도의 시가 실려 있다. 게다가 평생 지은 글의 절반 정도는 시다. 고려시대 문집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이색李穡(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이다. 《목은집》은 총 55권인데, 이 가운데 35권이 시다. 시가 절반을 웃돈다. 이색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던 시기에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인데,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를 지었던 것이다. 반면 조선 왕조 편에 섰던 정도전鄭道傳(1342~1398)의 《삼봉집三峯集》은 14권 중에 2권, 권근權近(1352~1409)의 《양촌집陽村集》은 40권 중에 10권이 시다. 개국 초기라서 할 일이 많았는지 시가 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의 비중은 다시 늘어난다. 이것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훈구파에 속하는 신숙주申叔舟(1417~1475)의 《보한재집保閑齋集》은 17권 중에 11권,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은 36권 중에 25권이 시다. 이들과 대립한 사림파의 영수 김종직金宗直(1431~1492)의 《점필재집?畢齋集》은 27권 중에 무려 23권이 시다. 훈구파도 사림파도 아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방외인 김시습金時習(1435~1493)의 《매월당집梅月堂集》 역시 전체 23권 중 시가 15권으로 절반이 넘는다. 구왕조의 수호자도, 신왕조의 개척자도, 훈구파의 거물도, 사림파의 지도자도, 그리고 시대의 반항아도 모두 일생을 시와 함께했다. 시는 그들 삶의 기록이자 삶의 일부였다.
과거시험은 종류도 많고 과목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입시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국·영·수 위주라는 점에 변화가 없듯이, 과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시詩, 부賦, 표表, 책策 네 가지다.
과거시험에 출제되는 글을 과시문科詩文이라고 하는데, 이 책들은 각종 과시문을 모은 것이다. 과시문에 관한 책은 지금 전하는 고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지금 수험생들은 몇몇 유명 출판사에서 만든 참고서와 문제집을 본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출판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만들어 봤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과시문 선집은 내용이 제각각이다. 책 이름도 제각각이다. ‘시학詩學’ ‘기교綺橋’ ‘적려摘驪’ ‘경보輕寶’ ‘성진聲振’ ‘금성金聲’ ‘영금쇄옥零金碎玉’ 등 제목만 봐서는 대체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다.
시학은 시를 배운다는 뜻이다. 기교는 아름다운 다리라는 뜻인데, 과거 급제로 가는 다리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적려의 적摘은 뽑는다는 뜻이고, 여驪는 운문에서 짝을 이루는 구절을 말한다. 과시문의 관건은 짝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는가에 있다. 경보는 가벼운 보배다. 작고 가볍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뜻인 것이다. 성진은 소리를 떨치다, 금성은 쇳소리라는 뜻이다. 중국 진晉나라 문장가 손작孫綽이 천태산天台山을 유람하고 글 한 편을 지었는데, 잘 지었다고 자부한 나머지 “이 글을 땅에 던지면 쟁그랑 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친구에게 말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끝으로 영금쇄옥零金碎玉은 금 부스러기와 옥 조각이라는 말인데, 귀한 글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책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출 문제와 답안이다. 과시문을 잘 짓기로 이름난 사람이나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과시문을 엮어 만든 책이다. 둘째는 예상 문제와 답안이다. 과시문의 출제 범위는 매우 넓어 경전, 역사책, 문학작품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출제돼 사서오경의 본문은 기본이고, 주석까지 암기해야 한다. 역사책은 《사기史記》 《한서漢書》 《통감通鑑》 등에서 출제될 때가 많은데, 주요 인물의 행적은 모조리 꿰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중국 시인들의 시문을 엮은 책이다. 작문의 기초를 닦는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었다. 이렇게 옛날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와 답안을 얻어서 옮겨 적기도 하고, 나름대로 출제 경향을 가늠하며 예상 문제와 답안을 작성해보기도 하고, 이름난 문인들의 글을 베끼면서 기초를 닦기도 했다.
11장으로 넘어와 저자는 ‘통감通鑑’이라고 쓰인 책을 보여준다. 《자치통감》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감절요通鑑節要》다. 우리나라 책들은 대개 여백이 상당했다. 여백의 미를 중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청이 출판을 주도했으므로 비용을 아낄 필요가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상업출판으로 만든 책은 대개 여백이 좁다. 잘라낸 부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상단과 하단의 여백은 물론 각 장 말미에 남은 빈칸마저 잘라내곤 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사에서였다. 저자의 손에 들어온 이 책은 첫 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지 손글씨로 보충했다. 그다지 잘 쓴 글씨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구차해 보이지만, 없어진 부분을 메우려는 궁여지책이다. 글씨는 잘 쓰지 못했지만 이 책의 주인은 책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모양이다. 전편에 걸쳐 표시해놓은 현토懸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걸 보면 책 주인이 이 책 전체를 독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장에 와서 저자는 ‘인문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질문을 던진다.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중국 고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수많은 중국 고전 가운데 강좌나 책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책은 다름 아닌 《논어》다. 저자가 가지고 있는 고서 더미에도 《논어》가 한 권 있다. 판본은 활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이다. 서지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서지적 가치가 높은 희귀한 책일수록 손댄 흔적이 별로 없이 깨끗하고, 흔해빠진 판본일수록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 책도 그렇다. 주인이 남긴 흔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 주인은 그다지 높은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었던 듯하다. 비교적 쉬운 내용도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으로 치면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책을 아끼고 공부하려는 열정만은 대단했다는 사실이다.
곳곳에 검은 줄, 붉은 줄이 쳐 있고, 자세히 보면 토를 달아놓았다. 상단에는 언해諺解까지 적어두었다.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학교 다닐 적에 쓰던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보면, 앞부분은 너덜너덜해도 뒷부분은 깨끗하기 마련이다.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책 주인이 책에 남긴 흔적은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흔적을 남겼다. 필기해놓은 내용이 뒤로 가도 줄어들지 않는다. 게다가 작은 글씨로 인쇄된 소주小註까지 다 읽었다. 곳곳에 구두句讀를 뗀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꼼꼼히 《논어》 21편을 다 읽었다면, 그는 뭐가 되도 될 사람이다. 책 주인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