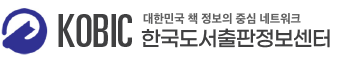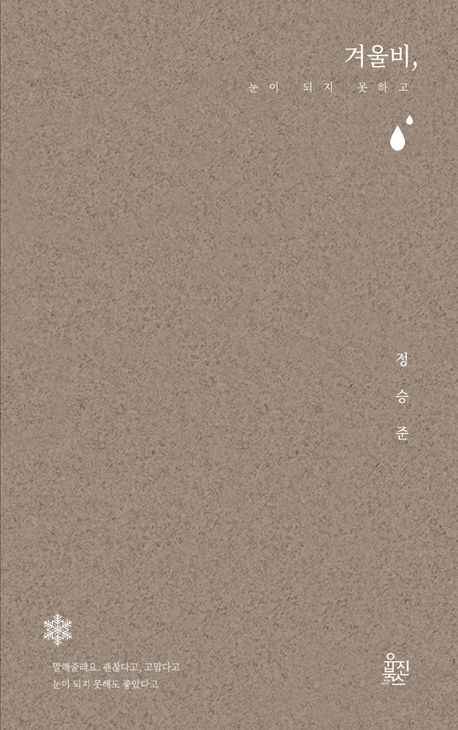전체 분야
도서분류
문학 > 한국시 > 현대시
도서소개
첫눈이 내리던 날 온몸으로 맞고 싶었죠. 하지만 시인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찬 겨울비가 가득할 뿐. 호사스러운 카페에서 통창 너머 비를 바라보는데 문득 겨울비가 측은하게 보이는 거야! 저라고 첫눈으로 내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고 싶은 많은 것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해 버린 시간과 미련들. 꼭 말해줄래요. 괜찮다고, 고맙다고. 눈이 되지 못해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여기 있는 것으로, 나에게 그리고 길동무에게
- 시인의 말
나는 아버지가 적어도 나의 시대보다 훨씬 평화롭지 않은 시절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왜 나는 아버지의 삶 또한 내가 듣고 연대한 많은 이들의 그것처럼 수많은 투쟁의 집합체라는 것을,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지점에서 나는 광장에서 처음 마주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졌다. 세상은 나의 슬픔에도 아픔에도 관심이 없다(p24, 〈기회〉)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다름은 틀림이라 말하는 사회에 선택지를 빼앗겼던 청년(p105, 〈민들레꽃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많은 일들에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p125, 〈핑계〉) 돌아보며 끝없이 생각을 멈추지 않는 지금의 아버지. 그런 것들은 짧은 문자열을 훑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것이었다.
- 에필로그 ‘나는 이 시들을 읽었다’ 중에서
저자소개
저자 정승준
한적헌, B-719라는 소행성에서,
의자 방향만 바꾸면 언제든 석양을 볼 수 있는 소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아침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우의 말처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시집 『또 하나의 질문』 유진북스(2020)
시집 『언 가슴 녹여 만든 봄날을』 유진북스(2022)
시집 『장마를 견딘 어느 여름날에』 유진북스(2023)
장마를 견딘 어느 여름날에
언 가슴 녹여 만든 봄날을
또 하나의 질문
목차
시인의 말 _3
1. 그리움, 차마 어찌하지 못해서 _9
〈Photo Poem〉 해바라기
겨울비 Ⅲ_ 10 / 난독증_ 11 / 소 치는 아이가 되고_ 12 / 쌀바위 가는 길에_ 13 / 약속_ 14 / 겨울 변명_ 15 / 길티 플레저_ 16 / 그런 한 사람_ 17 / 삶은 감자_ 19 / 저장강박증_ 20 / 오월 하순에_ 22 / 기회_ 24 / 첫사랑_ 26 / 동상이몽_ 27 / 해바라기_ 28 / 경고_ 29 / 그래도_ 31 / 아내에게_ 33 / 방앗간에서_ 35 / 청개구리 Ⅱ_ 37 / 해 질 녘에_ 39 / 내가 기억하는 시간_ 40 / 중산층_ 42 / 야구장 가는 길_ 43 / 비디오 판독_ 45 / 안녕, 광안리_ 46 /
2. 시인도 이야기 속에 자기는 없다 _47
〈Photo Poem〉 데칼코마니
겨울, 밤 지나 새벽이 오면_ 48 / 어느 겨울밤에_ 49 / 다시 입춘_ 51 / 문상_ 53 / 초승달_ 55 / 배롱나무꽃_ 57 / 보름달_ 58 / 봄날을 위해_ 59 / 바람, 바램_ 61 / 백년어서원_ 562 / 역설 Ⅰ_ 64 / 역설 Ⅱ_ 65 / 진즉 알았다면_ 66 / 일찍 핀 봄꽃_ 68 / 고사리_ 69 / 화가처럼_ 71 / 이팝꽃 흩날리는 밤에_ 73 / 라일락 뜨락 1956_ 75 / 오월에 오십시오_ 77 / 그날에_ 77 / 황매화_ 81 / 질문_ 82 / 먼발치 사람_ 83 / 왜_ 85 / 가을비 Ⅱ_ 86 /
3. 반가워, 깨달음으로 일구는 삶 _87
〈Photo Poem〉 도마
꽃밭에 둔 자전거_ 88 / 첫눈 오는 날에_ 90 / 선잠_ 92 / 잠 놓치고_ 94 / 달집 짓기_ 96 / 달님의 마음_ 97 / 그레샴의 세상_ 99 / 잘못된 이유_ 100 / 초보_ 102 / 봄날, 지렁이에게_ 103 / 민들레꽃이 뽑혔습니다_ 105 / 당신을 깨워 줄 사람 있습니까?_ 107 / 잡담_ 109 / 아무 일 없었다는 듯_ 110 / 하루 Ⅲ_ 112 / 업_ 113 / 로봇 청소기_ 115 / 방책_ 117 / 칼잠을 잔 상추_ 119 / 마늘 농사_ 121 / 눈 깜짝할 하루_ 123 / 핑계_ 125 / 전직으로 살기_ 127 / 지난 바람이_ 129 / 잠_ 131 / 그때도 오늘같이_ 132 / 청개구리의 눈물_ 134 / 동문서답_ 137 / 혼밥_ 139 / 몽땅 지렁이에게_ 140 / 열대야_ 142 / 텃밭 공화국_ 143 / 여름 폭우_ 145 / 엄살_ 147 /
4. 매번 흔들리며 함께 걷는 여행 _149
〈Photo Poem〉 여행자
사자평에서_ 150 / 같은 듯 다르게_ 151 / 흔들리며 가는 길_ 152 / 비행기는 멈출 때 더 굉음을 낸다_ 154 / 서울 가는 버스 안_ 156 / 하산 길에_ 158 / 연어_ 159 / 늘_ 160 / 한림항에서_ 162 / 비양도 가는 배에서_ 163 / 윗세오름_ 164 / 숨골_ 166 / 일출 보러 가는 길_ 167 / 제주에서 낙조를 보다_ 169 / 오솔길_ 170 / 운해_ 171 / 바탐섬으로 가면서_ 172 / 반딧불이를 찾아서_ 174 / 삼박 오일_ 176 /
5. 내 짐이 무거워 다시 꺼내는 기도_179
〈Photo Poem〉 일탈
아버지와 아들_ 180 / 다 이루기까지_ 181 / 적반하장 Ⅱ_ 183 / 선물 목록_ 185 / 아름다운 나라_ 186 / 새벽 예배당_ 188 / 이름값_ 190 / 녹슨 못으로_ 192 / 소격_ 194 / 잊고 산 것들_ 196 / 머피의 봄비_ 198 / 뫼비우스_ 200 / 잡풀_ 201 / 웃을 수 있다면_ 203 / 기도 Ⅳ_ 205 / 샐리의 법칙_ 206 / 새벽에 다시 드리는 기도_ 208 / 아마도 그럴걸_ 210 / 창세기 35장_ 212 / 깜빡깜빡_ 214 / 나와 나의 종을 위하여_ 216 / 어깨동무_ 218 / 이미 버렸노라!_ 220 / 혜존_ 222 /
에필로그 _223p
파워배드민턴 회원 작품_ 224
나는 이 시들을 읽었다_ 231
이제는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_ 236
서평
■
이전 세 권의 시집에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가족이라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의 슬픔 -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으로 행간을 채웠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던 수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읽어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피땀 위에 서 있음을 외면하고 나의 고생만을 고집하던 나의 독선이 보인다.
아버지 자신의 속을 길어내 쓴 글은 결국 그것을 읽는 나마저도 비추게 된다. 그러니 나는 나를 알기 위해서 이 시들을 읽는 것이다. 시를 읽지 않겠다는 오기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를 알려주기라도 하듯, 오랜 꿈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시들이, 드디어 자식에게서 해방되었음이 다행스러웠던 아버지의 인생 2막이, 결국 다시 나를 구성하는 일부로 돌아와 있다.
- 에필로그 ‘나는 이 시들을 읽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