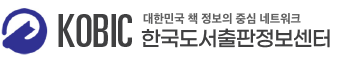전체 분야
도서분류
문학 > 나라별 에세이 > 한국에세이
수상 및 추천도서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21년 10월 4주 선정
도서소개
지금 당장 직업도, 먹고살 돈도 없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도, 전혀 가난해지지 않는다.
어쩌면 나의 조상은 수렵채집인인지도 모른다.
오늘의 먹을거리와 머물 곳을 찾아다니며, 하루를 하나의 삶처럼 살아내던 이들.
나는 다음 날, 다음 해도 아닌 당장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_본문 중에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20대 여성의 기쁨과 슬픔을 담아내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했다. 놀에서 출간된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은 결코 가난해질 수 없는 풍요로운 마음을 지닌 양다솔 작가의 희비극을 담은 첫 에세이다. 독립출판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여덟 시간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운 뒤, 여러 독립서점 추천도서로 선정되고 10쇄 이상 팔린 독립출판물 『간지럼 태우기』 속 글과 구독 메일링 서비스 ‘격일간다솔’에 연재된 글까지, 작가가 10년에 걸쳐 쓴 글들을 갈무리했다.
작가의 일상을 엿본다면 누구라도 “참 잘 산다”고 말할 것이다. 여름이면 사흘에 한 번씩 수박이 집 앞으로 배달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업소용 팥 통조림은 빙수를 열 번은 해 먹고도 남아서 당근마켓으로 동네 사람들과 나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밥상을 위해 빌라 앞 화단에서 쌈 야채를 키워 강된장과 곁들여 먹고, 전 세계의 향신료를 써서 자정까지 비건 도시락을 싼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걸 느끼기 위해 직접 봉숭아를 키워 손톱에 물을 들인다. 주변인들은 그를 보고 감탄하며 말한다. “이토록 궁상맞고 사치스러운 인생이라니. 양다솔이 진정 가난해질 일은 없을 것이다(이슬아).” “양다솔은 나의 아이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양다솔처럼 살고 싶다(요조).”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은 소유와 소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저자의 모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추천사
이슬아 (작가, 헤엄 출판사 대표)
양다솔을 만나고 온 밤엔 꼭 글을 쓰게 되었다. 양다솔과 친구가 아니었다면 결코 쓰지 못했을 문장들이 내 책엔 수두룩하다. 하지만 나의 문장으로는 그가 지나가듯 던진 농담 한 편조차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양다솔의 이야기는 반드시 양다솔의 기세 좋은 말씨로 들어야 한다. 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양다솔이라는 기막힌 코미디언의 데뷔를 말이다. 이렇게 웃기고 고달프며 엉망으로 훌륭한 애를 나만 안다는 게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를 지경이었다. 드디어 완성된 그의 첫 책을 읽다가 방바닥을 쾅쾅 치면서 웃고 금세 셔츠 소매로 눈물을 훔친다. 책장을 덮으면서는 어김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는 것이다. 이토록 굉장한 희비극이라니. 이토록 궁상맞고 사치스러운 인생이라니. 내 절친의 오리지널리티에 탄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의 가슴팍에 새겨진 소나무처럼 사계절 내내 씩씩한 마음을 이 책에서 본다. 양다솔이 진정으로 가난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쓰는 글은 언제고 이부자리를 벗어날 기운을 준다.
요조 (뮤지션, 작가)
몇 번이나 나에게 당도했던 문장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선물했던 것이다.” 한 친구는 이 문장 아래에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것’만이 진정 ‘내 거’”라고 썼다. 이 문장에 따르면 양다솔은 모든 걸 가졌다. 다 주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꼭 맞는 사랑을 주려고 아예 엄마의 엄마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친구의 친구가, 적의 적이, 양다솔의 양다솔이 되니까. 매번 그렇게 거뜬히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니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란 불가능하다. 당연하지만 양다솔은 요조의 요조가 되어주었던 적도 있다. 나는 그가 내게 보여준 요조를 만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양다솔은 나의 아이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양다솔처럼 살고 싶다.
이길보라 (영화감독, 작가)
양다솔의 글은 웃기고 이상하면서 다정하고 탄탄하다. 본투비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글솜씨에 숨을 들이마시고 별 걱정 없이 웃을 준비를 하다가도 어쩐지 품위가 느껴져 숙연하게 밑줄을 치게 된다. 누구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보이차를 내려 마시며 무심하게 왔냐고 묻고는 오늘도 끝내주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좌중을 휘어잡는 그가 종종 부럽다. 익살스럽지만 끝내 기품을 잃지 않는 해학으로 동시대를 사는 양다솔이 내 친구라서, 이야기꾼이라서, 작가라서 정말 기쁘다.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양다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통 갈피를 못 잡는 사람. 마치 눈떠보니 11시인 기분이다. 뭘 하기엔 늦었고 안 하기에도 아쉽다. 갑자기 절에 행자로 출가하고 유럽으로 무전여행을 떠나며 모험가처럼 살다가 어느 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어쨌든 큰소리치는 이야기는 말은 기뻐야 힘이 나고 글은 슬퍼야 깊이가 있다는 것이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곁에 두기 힘들고, 쓰는 글마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밥맛이 없다. 10년간 쓴 수필을 모아 『간지럼 태우기』라는 독립출판물을 발행했고, 동북구연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책 없이 백수가 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격일간 다솔’이라는 메일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음 달부터 뭘 해서 먹고살지 전혀 계획이 없는데 당장 밥을 엄청 잘 차려 먹는다.
적당한 실례(큰글자도서)
적당한 실례
아무튼, 친구
목차
1장 수렵채집인의 후예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011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 021
일력 035
일어나서 웃겨봐 048
오후 3시의 빛 057
내가 때린 할아버지들 061
모녀전철 073
겨울처럼 쌓이는 096
완벽한 비극에 대하여 105
2장 열혈우정인의 삶
친구 발견 113
파더스 어드벤처 127
엄마와 한 달 살기 (1) 153
엄마와 한 달 살기 (2) 164
겨울이 없는 집 176
엄청나게 차갑고 믿을 수 없이 뜨거운 181
달팽이 이야기 186
나의 코미디언 197
3장 삶이 유랑하는 순간
최초의 만찬 211
윤 수사관을 기다리며 222
언어에 대한 변 228
베스트 워먼 윈즈 232
주치의를 위하여 249
두 남녀 258
노민정 씨, 당신을 신고한다 268
4장 가난해도 화려할 권리
아감, 나에게 구멍을 뚫어준 남자 277
One Tinder day 291
아직은 잘리지 않았다 295
바이브 306
여름의 도매상 316
환절기 324
홈리스 327
서평
“양다솔을 만나고 온 밤이면 나는 꼭 글을 쓰게 되었다.”_이슬아
기쁨은 말로 하고 슬픔은 글로 쓰는 씩씩한 광대
도시 풍자 스탠드업 코미디언 양다솔의 경쾌한 자조
★이슬아, 요조, 이길보라 강력 추천!★
“안분지족, 소확행은 사절이다.
사는 동안 한껏 화려하고 자유로울 테다.”
20대 새로운 이야기꾼 양다솔 첫 에세이
20대에게 도시는 녹록치 않은 풍경들로 가득하다. 특히 서울이 아닌 어딘가에서 올라온 무산자 계급 여성, 학자금대출을 이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90년대생, 회사가 강남에 있지만 회사 앞에서의 자취는 꿈도 못 꿀 사회초년생이라면 도시에서의 삶이 생활보다 생존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양다솔 작가는 서울 언저리에서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빠르고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비용은 단순히 공간의 좁고 값비쌈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빨간 광역버스에서 보내는 세 시간, 지하철에서 팔뚝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가는 누군가와 마주하는 일까지를 포함한다.
모으든 쓰든 모두가 비슷하게 가난하고 비슷하게 살 만할 ‘보편적 가난’의 시대.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일상이, 마음이 가난하리란 법은 없다. 작가는 존엄성을 미세하게 갉아먹는 일들은 내려놓고 그 자리를 일상을 챙기는 노력으로 채워간다. 내일의 비건 도시락을 위해 자정까지 공들여 하는 요리, 기념일마다 장만한 다기로 매일 아침 내리는 보이차, 첫 출근 날 혼자서라도 챙기는 든든한 저녁 외식.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에서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나’는 꼭 필요한 미덕이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그 기준이 획일화되는 와중에도 작가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간다. 그날의 먹을거리와 머물 곳을 찾아다니며 하루를 하나의 삶처럼 살아내던 수렵채집인의 방식을 닮아간다. 생산과 소비의 굴레에 갇히는 대신 일상의 페달을 누구보다 부지런히 밟으면서.
“양다솔이 진정으로 가난해질 일은 없을 것이다.”_이슬아
성인이 된 작가가 독립하면서 구한 첫 집은 으슥한 공단 동네에 있었다. 수명이 다해서 가스 요금을 그 건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좀비 보일러’와 뽁뽁이 붙인 창문으로 매년 겨울을 나는 작가는 ‘가난하지만 똑똑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타려고 신청서에 자신의 가난을 실제보다 비참한 어조로 서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신청서에는 예쁜 옷과 조리 도구를 사기 위해 버스를 타는 대신 산책 삼아 걸어 다니고, 친구에게 값싸고 싱싱한 꽃을 선물하기 위해 새벽 꽃시장에 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비극은 이야기가 아닌 앵글에 있었다.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은 생계가 허락하는 안에서 소확행으로 견디며 임시적으로 사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것을 놓지 않는 태도다. 이사 때마다 “이런 것이 대체 아가씨 집에 왜 있느냐”라는 참견을 감내하면서도, 장정 넷이 들어야 하는 돌침대와 벤저민 나무, 다도상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또 강의 출석만 찍으러 온 여배우, 마임 예술가 등 그날의 ‘컨셉’에 맞춰 뻔뻔하게 고른 옷이 빠르고 확실하게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각자의 고됨을 알아주는 쉴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안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다.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안에서 나만의 쉴 곳을 발견해내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절망을 씩씩하게 다루고
그 시간으로 타인을 웃길 수 있다면
저자 스스로 구독자를 모집하는 연재 메일링 서비스는 신호탄격인 ‘일간 이슬아’를 시작으로 문학계에 자리를 잡았다. 저자는 독자에게 연재료를 받아 생계를 해결하고, 실체 없던 독자와 만나는 과정을 통해 집필과 마감의 원동력을 얻는다. 양다솔 작가 역시 에세이 출간을 앞두고 ‘격일간 다솔’을 시작했다. 독자들은 “웃겨서 마룻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읽었다” “여러 작가의 글을 구독했지만 회신을 보내보기는 처음이다”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선물 상자를 여는 느낌이다”라고 화답했다.
‘MZ세대’라는 틀에 들어갈 법한 작가의 이력은 사실 한마디 수식어로 규정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때 목탁 소리에 반해 미성년자 최초로 정토회 행자가 되어 출가했고, 그곳에서 10대 시절의 2년을 보냈다. 학창시절 글방에서 만난 90년대생 작가들, 이길보라, 이슬아, 이다울, 하미나와 교류하며 친구들 일이라면 만사 제치고 나서는 ‘열혈우정인’으로 살아왔다. 스물한 살에는 유럽으로 무전여행을 떠나 대학생 배낭여행객이 갈 법하지 않은 관광지 이면을 목격한다. ‘기쁨은 말로 하고 슬픔은 글로 써야 한다’는 자신만의 슬로건처럼, 삶의 희비극을 스탠드업 코미디와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꾸준히 풀어내는 중이다. ‘동북아국제구술문화연구회’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그룹에서 활동하며 절망을 씩씩하게 다루고 그 시간으로 타인을 웃기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장기적인 인생 계획보다는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눈을 반짝이고, 메일링 구독 서비스나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품이 많이 드는 동아리 활동’ 같은 데 골몰하는 작가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대책 없어 보일 터다. 하지만 작가는 ‘살고 싶은 삶’보다 ‘살고 싶은 하루’에 집중할 때 삶은 오래도록 빛난다고 확신하며, 그 삶을 직접 실험해본 바 말한다.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도, 나는 전혀 가난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