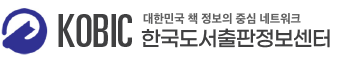전체 분야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
출판사
출판사연락처
02-6373-6740 / 010-5743-5782
출판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0(신수동) 화수목빌딩 5층
쪽수
424
ISBN
9791160405125
크기
155 * 225 * 31 mm / 758 g
도서분류
예술 > 영화 > 영화이야기
수상 및 추천도서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22년 8월 2주 선정
도서소개
우리를 매혹시킨 영화들의 몰랐던 뒷모습을 쫓다
유쾌한 입담으로 영화광들을 사로잡은
영화평론가 주성철의 “아는 영화 모르는 이야기”
이 책은 〈씨네21〉, 〈방구석1열〉, 〈무비건조〉 등 수많은 영화 콘텐츠를 통해 유쾌한 입담을 자랑해온 ‘영화광’ 주성철 평론가가 들려주는 ‘아는 영화들의 몰랐던 이야기’이다. 20여 년간 말과 글을 통해 치열하게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온 그가 그동안의 애정의 흔적들을 모아 엮은 ‘첫 번째 영화평론집’이기도 하다.
주제 혹은 소재에 따라 영화를 한 편씩 나열해 설명하던 기존 영화 평론집들과 다르게, 전시를 관람하듯 영화적 사유를 확장하는 구성이 인상 깊다. 감독이 천착하는 주제와 그로부터 뻗어나가는 세계관을 추적해가는 〈감독관〉, 영화 속에서 탄생해 피어나고 무르익는 배우들의 연기 세계를 쫓는 〈배우관〉, 장르의 렌즈를 통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함께 사유해보는 〈장르관〉, “모든 감독은 단편으로 시작했다”는 말처럼 단편을 통해 거장들의 영광스러운 시작을 발견하는 〈단편관〉까지. 영화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영화의 뒷이야기’가 박진감 넘치게 이어진다.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영화 평론집을 멀리했던 독자라도, 주성철의 ‘영화 수다’ 앞에서는 흥미진진하게 눈을 밝힐 것이다. 더불어 〈기생충〉, 〈미나리〉,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의 대변혁기를 선도하고 있는 최신 작품들도 함께 논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목격하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영화 기자, 에디터, 평론가의 정체성을 오가며 영화 곁에 늘 함께해온 저자는 “아마도 영화만큼 강렬한 예술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함께 나누고 싶어 미칠 것 같던 말들. 주성철 평론가의 수줍고 달뜬 이야기들이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추천사
봉태규 (배우)
내가 아는 주성철 기자는 무척 재미난 사람이다.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그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역시 재미난 사람이군!’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된다. 놀라운 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주성철은 더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말이 아닌 글이라면 더욱더. 이런 주성철이 영화를 글로 풀어낸 책을 냈다. 책을 읽자마자 그의 밑도 끝도 없는 재미에 모두들 푹 빠져들 거라 장담한다. 레드 썬!
이경미 (영화감독)
아는 영화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십을 나누며 낄낄 대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다며 잘난 척 해도 밉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고. 히치콕이 얼마나 변태였는지 다들 궁금하지? 그건 나만 알아야지. 그런데 주성철 기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으로 낸다니 정말 신난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까. 무려 22년째 오로지 영화를 이야기해온 사람이 들려주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라니! 그래서 급한 마음에 먼저 읽어봤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읽어버렸다. 우리가 아는 영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까지 고맙게도 기억해주고 들춰내어주어 몹시 반갑다. 한 가지를 두고 오랫동안 좋아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귀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압력이다. 또 써달라
상세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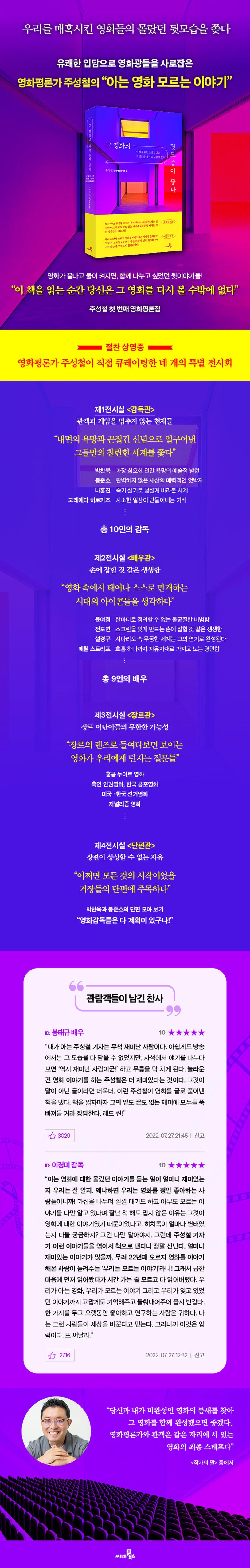
저자소개
저자 주성철
영화평론가. 영화잡지 〈키노〉 〈필름2.0〉을 거쳐 〈씨네21〉에서 편집장으로 일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우리 시대 영화 장인》 《데뷔의 순간》 《두기봉》 《영화기자의 글쓰기 수업》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공저) 등을 썼다. SBS 〈접속! 무비월드〉와 〈금요일엔 수다다〉, 채널CGV 〈더 굿 무비〉, SK Btv 〈무비빅〉, KBS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 JTBC 〈방구석1열〉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OCN 영화 프로그램 〈O씨네〉와 유튜브 〈무비건조〉에 출연 중이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
목차
작가의 말
제1전시실 감독관
박찬욱: 가장 심오한 인간 욕망의 예술적 발현
봉준호: 완벽하지 않은 세상의 매력적인 엇박자
류승완: 오리지널을 넘어서는 독보적 장르
나홍진: 죽기 살기로 낯설게 바라본 세계
김기영: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원초적 광기
고레에다 히로카즈: 사소한 일상이 만들어내는 기적
요르고스 란티모스: 폐쇄된 시스템과 기기묘묘한 인간들
마틴 스코세이지: 노장이 증명해낸 영화의 무한한 잠재력
켄 로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나아지고 있는가
쿠엔틴 타란티노: 관객과 게임을 멈추지 않는 장르 탐식가
제2전시실 배우관
윤여정: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불균질한 비범함
전도연: 스크린을 잊게 만드는 손에 잡힐 것 같은 생생함
설경구: 시나리오 속 무궁한 세계는 그의 연기로 완성된다
공효진 × 봉태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감각과 정서
메릴 스트리프: 호흡 하나까지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명민함
주성치: 액션과 코미디를 넘나드는 능청스러운 재주꾼
찰리 채플린: 세상의 희비극에 통달한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
오드리 헵번: 세상을 사랑에 빠뜨린 영원한 페어 레이디
제3전시실 장르관
‘홍콩 누아르’의 발명: 〈영웅본색〉 시리즈의 추억
B무비의 거장들: 켄 러셀과 존 워터스
프랑스 영화는 어렵지 않다: 장 피에르 멜빌과 클로드 샤브롤
흑인 인권영화: 〈노예 12년〉과 〈셀마〉
한국 공포영화: 〈여고괴담〉과 〈알포인트〉
미국 선거영화: 〈밥 로버츠〉와 〈왝 더 독〉
한국 선거영화: 〈특별시민〉과 〈댄싱퀸〉
저널리즘 영화: 〈나이트 크롤러〉부터 〈신문기자〉까지
오시마 나기사와 기타노 다케시: 〈감각의 제국〉과 〈하나-비〉
이장호와 정지영: 〈바보 선언〉과 〈하얀 전쟁〉
김윤석과 곽경택: 〈극비수사〉와 〈암수살인〉
제4전시실 단편관
박찬욱의 단편영화관
봉준호의 단편영화관
서평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영화가 좋아지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진 않는다. 다만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보니 영화가 더 재미있네’라는 식으로, 영화를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기쁠 것이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절찬 상영중★
주성철 평론가가 직접 큐레이팅한 네 개의 특별 전시회
제1전시실 〈감독관〉
관객과 게임을 멈추지 않는 천재들
내면의 욕망과 끈질긴 신념으로 일구어낸 그들만의 찬란한 세계를 쫓다
영화는 그들의 영감에서 최초로 탄생한다. 영화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이 전시의 시작이 〈감독관〉이어야 하는 이유다.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나홍진, 김기영이라는 한국 영화사의 뜨거운 이름들 이후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요르고스 란티모스, 마틴 스코세이지, 켄 로치,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세계 영화사의 한 분기가 되는 이름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총 10명의 감독이 내면의 욕망과 끈질긴 신념으로 일구어낸 찬란한 세계를 쫓다 보면 그들의 세계가 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이 도약하는 것이다.
‘속죄와 믿음의 문제’라는 테마를 끈질기게 탐구해온 박찬욱, ‘한국적 현실에 대한 치밀한 천착’을 기조로 디테일 속의 어긋남을 추구하는 봉준호,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는 깨달음을 작품 세계로 들여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들은 모두 몰두하는 테마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변주해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간다. ‘미친 이야기’로 영화인들의 소화불량을 일으켰던 나홍진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켄 로치는 상상력을 넘어 생명력으로 날뛰는 영화의 현장이 어떠한 것인지 생생히 증명해낸다. 그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원초적 광기’를 다룬 김기영과 ‘끊임없이 영화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천재 노장’ 마틴 스코세이지가 후배 영화인들에게 끼친 영향, ‘독보적 장르를 구축’한 류승완과 ‘장르 탐식가’ 쿠엔틴 타란티노의 세계관 면면들도 모두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에 담겨 있다.
제2전시실 〈배우관〉
손에 잡힐 것 같은 생생함
영화 속에서 태어나 스스로 만개하는 시대의 아이콘들을 생각하다
감독의 영감에서 영화가 탄생한다면, 실로 영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배우다. 감독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관객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배우들. 윤여정, 전도연, 설경구, 봉태규, 공효진이라는 한국 영화의 빛나는 이름들 이후로 메릴 스트리프, 주성치, 찰리 채플린,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광이라면 사랑해 마지않는 이름들이 이어진다. 총 9명의 배우들은 과거의 자신과 싸워가면서 늘 갱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나간다.
감독의 세계가 배우를 통해 완성된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방은진 감독은 전도연에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를 물었고, 강우석 감독은 설경구에게 “알아서 잘 만들어줘”라며 부탁했다. 배우들에게 캐릭터가 주어지는 순간, 그들은 감독의 손을 벗어나 스스로 피어나고 무르익는다. 감독들의 감독, 김기영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주며 불균질한 비범함을 맘껏 뽐냈던 윤여정, 삶의 신념을 영화 속에서도 맘껏 펼쳐내며 ‘배우가 산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증명한 메릴 스트리프는 단연코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영화 산업을 지탱해온 이름들이다. 봉태규, 공효진이 자신만의 정서로 완성해온 ‘전대미문’의 캐릭터들부터 주성치, 찰리 채플린, 오드리 헵번이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온 과정까지 낱낱이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3전시실 〈장르관〉
장르 이단아들의 무한한 가능성
장르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감독’과 ‘배우’라는 키워드가 영화의 밖을 탐구하는 유용한 도구였다면, ‘장르’라는 렌즈는 영화의 내부를 비교적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 전시실에서는 홍콩 누아르, B무비, 흑인 인권영화, 한국 공포영화, 선거영화, 저널리즘 영화 등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와 방식에 따라 총 11개의 주제를 탐구한다. 장르 영화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반복적인 ‘컨벤션(관습)’이 특징이다. 이 컨벤션에는 대중의 무의식이 반영되기에, 장르 영화는 우리의 역사, 사회 문제, 더 나아가 우리가 당연하다 여겨온 관념까지 담는다. 한국 공포영화로 대표되는 〈여고괴담〉과 〈알포인트〉에서 각각 한국의 입시 교육에 대한 비판, 베트남전에 대한 반성을 읽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다. 장르 영화는 그들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주하고 나아가며 시대의 질문을 건져 올린다. 그동안 단순히 재미로만 장르 영화를 즐겨온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영화로 시대를 사유하는 방법과 관점을 새롭게 얻어갈 것이다.
제4전시실 〈단편관〉
장편이 상상할 수 없는 자유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 거장들의 단편에 주목하다
“모든 감독은 단편으로 시작했다.” 이 말은 박찬욱과 봉준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그동안 장편만큼 잘 다뤄지진 않았지만, 두 거장 감독들이 치밀하게 공들여온 단편의 세계를 탐구한다. 박찬욱은 2010년 이후 매년 단편 작업을 이어오고 있고, 오랜 시간 미쟝센 단편영화제에 참여할 만큼 단편에 대한 애정이 크다. 또한 그는 동생 박찬경 감독과 함께 ‘파킹 찬스’라는 이름의 단편 프로젝트 그룹을 꾸리기도 했다. 〈심판〉부터 〈일장춘몽〉까지, 단편영화에 숨겨져 있는 그의 장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의 단서들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봉준호 또한 “단편으로 시작한 것을 넘어, 늘 단편과 함께”였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 찍은 〈백색인〉부터 학교에서 과제로 만든 습작 〈프레임 속의 기억들〉까지, 작품 활동 초기의 짧은 단편에서도 〈기생충〉으로 이어지는 ‘봉준호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봉준호 감독이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애써왔다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름을 시사한다. 두 거장의 단편을 모두 살펴본 독자들은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영화감독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