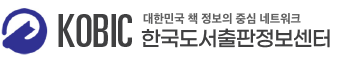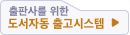전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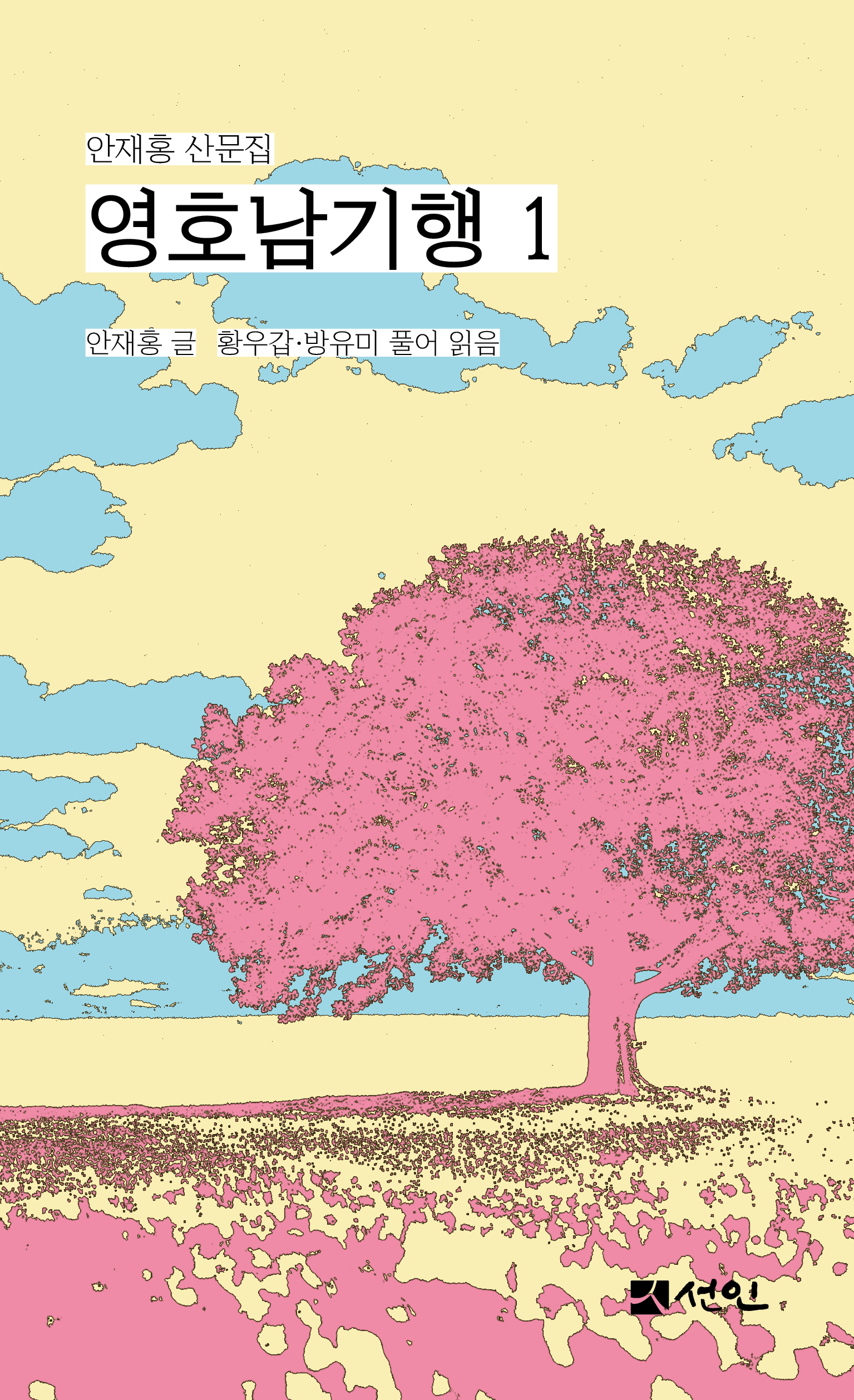
영호남기행 1
출판사
출판사연락처
02)718-6252/6257
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8길 1(신월동 163-1) 1층
쪽수
192
ISBN
9791160689273
크기
130 * 213 mm
도서분류
문학 > 나라별 에세이 > 한국에세이
도서소개
민족지성 민세 안재홍 선생이 쓴
1926년 영호남 지역의 풍경과 성찰
이 글은 1926년 봄 민세 안재홍의 영호남 기행문을 풀어 쓴 것이다. 민세는 1926년 4월 16일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열리는 ‘경남 기자대회’를 계기로 경성(현재의 서울특별시)을 떠나 고향 진위(현재의 평택시)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경부선 길을 따라 영호남행을 시작했다. 여행 기간은 1926년 4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였고 같은 해 4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자신이 주필로 재직했던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이 글의 일부는 해방 이후 「춘풍천리」, 「목련화 그늘에서」라는 제목으로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았다. 민세는 다수의 기행문을 남겼으나 현재까지 책으로 출간된 것은 1931년에 나온 『백두산등척기』 뿐이다.
민세가 쓴 기행문의 특징은 ‘체험적 글쓰기를 통한 실제적 기행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칫 감정 과잉에 빠져 감상적인 글로 흐르거나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만 급급해 문학성을 갖추지 못한 글쓰기로 전락해 버리기 쉬운 것이 기행문이다. 글쓴이의 체험에서 얻은 느낌이나 깨달음을 기술하는 게 기행문이 속한 교술 갈래의 장르적 특징이기는 하지만, 민세의 기행문은 체험적 글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명한 사적지를 둘러보는 관광, 또는 한가롭게 유람한 후 남긴 소감문의 차원이 아니며 관념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한 현학적인 글도 아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반영된 현장성, 망국의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반영된 시대성, 조선인 개인으로서의 우리 국토와 역사, 민족에 대한 애정이 담긴 민세의 기행문은 말하자면 실제적 기행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이광수 기행문의 심미적 글쓰기, 최남선 기행문의 이념적 글쓰기와 구별되는 안재홍 기행문의 특징이자 우리가 민세의 기행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세에게 여행은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온몸으로 감각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선의 여행 경로에서부터 흐르는 강물, 차창 밖으로 보이는 조선 사람들, 흩날리는 벚꽃의 이파리 하나까지, 여행 중 감각한 모든 것이 경제, 문화, 정치 등 담론의 차원에서 기록되었다. 여기에 해박한 역사 지식과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고전의 인용이 더해져 민세의 기행문은 한층 더 깊이 있는 문학작품으로 읽힌다. 천천히 여러 번 읽으며 곱씹을수록 98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민세의 통찰력과 문체의 아름다움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926년 당시 민세의 기행은 실시간으로 신문에 연재되었고, 독자들은 그의 여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금은 비록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 영호남 기행문을 통해 민세의 여정, 견문, 감상을 공유함으로써 민세의 체험을 상상해 보게 된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상상력은 이 글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2026년이면 이 기행문이 발표된 지 100년이 된다.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민세의 주옥같은 기행문을 현대어로 풀어 일반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수필을 통해 그동안 언론인이나 정치가로 알려졌던 민세가 한국 근현대 수필문학사에도 중요한 작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안재홍 安在鴻, 1891~1965
민족운동가·언론인·정치가·문인
호는 민세(民世). 1926년 4월 영호남 일대를 답사하며 14일의 여정을 꼼꼼하게 글로 정리한 저자는 영호남 지역의 임진왜란 사적지 등을 두루 돌며 해박한 통찰로 민족 의식 고취에 힘썼다.
1891년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동안 9차례에 걸쳐 7년 3개월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다. 조선일보 주필·사장을 역임하며 장강대하의 명문장으로 일제 식민통치를 맹렬히 비판했고,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 조선학을 강조하며 한국 고대사 연구와 충무공 이순신, 다산 정약용 재조명에도 힘썼다. 해방 후에는 “신민족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며 좌우협동의 통일 민족국가 수립에 힘썼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북한군에 납북되어 1965년 3월 1일 평양에서 별세했고, 1989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풀어 읽은 이
황우갑 민세아카데미 대표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민세아카데미 대표,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신간회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있다. 저서로 『성인교육자 민세 안재홍』 등이 있다.
방유미 민세아카데미 이사
단국대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민세아카데미 이사로 있다. 저서로 『안재홍의 민족운동 연구 1』 등이 있다.
표지 디자인 장슬기
목차
경부선
부산
진해 · 마산
통영
진주
하동 · 쌍계사
지리산
남원
전주
주
안재홍 연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