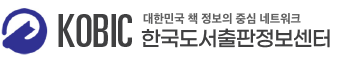전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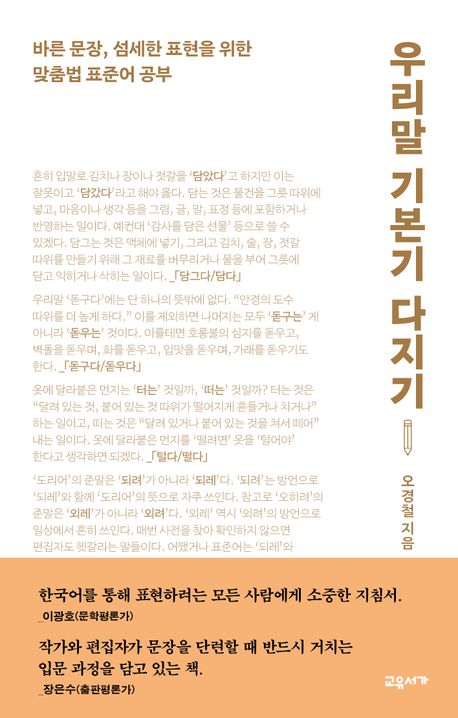
도서분류
인문학 > 독서/글쓰기 > 글쓰기 > 한글맞춤법
도서소개
20년 차 편집자가 실전 경험 속에서 가려 뽑은
헷갈리기 쉽고 잘못 쓰는 일이 많은 우리말 127쌍,
더 나은 우리말 사용자가 되기 위한 맞춤법 표준어 공부!
“밥 먹듯이 사전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쭙잖게나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징한(깨끗하고 맑은) 생각은 정확한 문장에 담긴다는 사실이다.”
추천사
이광호 (문학평론가,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우리말을 바로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가장 정교한 사유는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고, 언어 표기법의 적확성은 그 사유의 밀도를 만드는 기본이다. 오랜 편집자 생활의 경험과 한국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한국어를 통해 표현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는 말들의 표기를 바로잡는 것은 생각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한국어를 그토록 오래 사용해 왔음에도 ‘이걸 몰랐구나’ 하는 부끄러움과 또 다른 발견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풍부하고 매력적인 문학 예문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문학적이다. 이를테면 ‘그슬다/그을다’의 구분을 보자. 이 타동사와 자동사의 차이에는 ‘문학적인 것’이 있다. 이를테면 ‘그슬린’ 내 마음과 ‘그을린’ 내 마음 사이에 있는 시적인 간격처럼 말이다.
저자소개
저자 오경철
서울에서 나서 인천에서 자랐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스물여덟 살 때부터 출판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스무 해 가까이 우리말의 수풀에서 헤매고 있다. 첫 직장은 문학동네, 마지막 일터는 민음사로 사이사이 크고 작은 몇몇 출판사에 적을 두고 문학서와 교양서를 만들었다. 출퇴근하기가 싫어 집에 들어앉아 있을 적에는 김영사, 문학과지성사, 창비 등 여러 출판사의 갖가지 원고를 교정하고 교열하며 먹고살았다. 한때 혼자서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세상사에 염증이 나면 낭인인 양 책과 술을 벗 삼아 허송세월한다. 두 고양이가 놀고 쉬는 작은 서재의 책장 앞에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가 많다. 『편집 후기』 『아무튼, 헌책』 『판타스틱 북월드』(공저)를 썼다.
아무튼, 헌책(큰글자도서)
판타스틱 북월드
교유서가 10주년 기념 작품집 세트
아무튼, 헌책
편집 후기
목차
머리말
1.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헷갈리는 말
가름/ 갈음
결재 / 결제
그러네 /그렇네
끗/ 끝
너머/ 넘어
노름/ 놀음
띄다 / 띠다
부치다 /붙이다
싸이다 /쌓이다
안치다 /앉히다
왠 /웬
이따가 /있다가
조리다 /졸이다
해지다/ 헤지다
2.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혼용되는 말
꼽다/ 꽂다
난방/ 남방
담그다 / 담다
당기다 / 댕기다 / 땅기다
돋구다/ 돋우다
두껍다 / 두텁다
들르다 / 들리다
맞추다/ 맞히다
목울대 /목젖
바라다/ 바래다
박이다 / 박히다
벌리다 / 벌이다
붇다/불다/붓다
빌다 / 빌리다
썩이다 /썩히다
오로지/오롯이
웃옷/윗옷
젖히다 /제치다 /제끼다
처지다 /쳐지다
켜다 / 키다
3. 비슷한 듯하지만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
가능한 / 가능한 한
간여/ 관여
갱신 / 경신
공포 /공표
그슬다 /그을다
깃들다/ 깃들이다
깨우치다 / 깨치다
늘리다 / 늘이다
밤새다 / 밤새우다
보전 /보존
부문/부분
부터/에서
사달 /사단
사체 /시체
신문/심문
애끊다/애끓다
외골수/외곬
운명/유명
일절 /일체
적확하다 / 정확하다
주년 / 주기
쥐다 / 쥐이다
참가/참석/참여
참고 /참조
털다 / 떨다
펴다 / 피다
햇볕 / 햇빛 /햇살
4. 옳은 말, 그른 말
가리어지다 / 가리워지다
-건대 /-건데
걸맞은/ 걸맞는
검은색/ 검정색
구레나룻/구렛나루
그러고는/그리고는
내로라하다 / 내노라하다
노래지다 / 노레지다
놀래다/ 놀래키다
덥히다 /데우다/데피다 / 뎁히다
돋치다 / 돋히다
둥/동/ 등
되레 / 되려
-ㄹ는지/-ㄹ런지
며칠 / 몇 일
비비다 /부비다
부서지다 /부숴지다
삼가다 /삼가하다
-스러운/-스런
아비/애비/어미/에미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어쭙잖다 /어줍잖다
우려먹다 /울궈먹다
잠그다 / 잠구다
저 자신 / 제 자신
전 / 절은
조용히 하라/조용하라
졸리다 /졸립다
주야장천 /주구장창
집어치우다 / 집어치다
차이다 /채이다
파이다 / 패이다
5. 잘 띄고 잘 붙여야 하는 말
같이 하다/ 같이하다
걸 /-ㄴ걸 /-ㄹ걸
그럴 듯하다/그럴듯하다
-ㄴ바 / 바
듯/듯이/ 듯하다
-ㄹ밖에/ 밖/ 밖에
-ㄹ뿐더러/ 뿐
만 하다/ 만하다
못 다/못다
못 하다/못하다
우리 나라/우리나라
이 외/이외
치고 /치다
큰 소리/큰소리
하고 / 하며/ 하다
한 번/ 한번
6. 품사가 다른 말
깨나/꽤나
마냥/처럼
아니오 /아니요
엄한 /애먼
완전 /완전히
않는가 / 않은가
어떤 /어떨 /어쩔
7. 다른 말에 붙는 말, 활용하는 말
-대 /-데
-던지/-든지
-라/-으라 /-아라/-어라
-래야 /-려야
-시키다 /-하다
에/에게
-에요 /-이에요 /-예요
-요 /요 /이요
서평
우리말을 바로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가장 정교한 사유는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고,
언어 표기법의 적확성은 그 사유의 밀도를 만드는 기본이다.
_이광호(문학평론가,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다른 말과 틀린 말을 가릴 수 있고,
헷갈려서 잘못 쓰기 쉬운 말을 추릴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문장 감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계단을 밟는다.
_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전 민음사 대표이사)
문학동네, 돌베개, 민음사 등에서 오랜 세월 편집자로 일한 저자가 ‘바른 문장, 섬세한 표현을 위한 맞춤법 표준어 공부’ 『우리말 기본기 다지기』를 펴냈다. 편집자로 지내 오는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독자로 지내 온 때부터, 저자의 곁에는 항상 국어사전이 있었고, 긴 세월 동안 사전을 들여다보면서 저자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가 하면, 눈을 감거나 돌리고 싶을 만큼 흉하고 지저분한 문장 또한 있다. 그리고 규칙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문장은, 단언하건대 후자의 신세만큼은 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적었다. 우리가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우리말 문장을 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저자가 이 책을 펴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이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려 뽑은, 헷갈리거나 잘못 쓰기 쉬운 우리말 127쌍과 해당 단어들의 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예문을 함께 실었다. ‘이게 틀린 표현이었다고?’ 싶은 단어들부터, 무언가 둘 중 하나가 틀린 표현인 줄은 알지만 “매번 사전을 찾아 확인하지 않으면 편집자도 헷갈리는 말들”까지, 이 책에 실린 우리말과 예문을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헷갈리거나 잘못 쓰는 말들이 점차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존재를 모르는 독자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되도록 간결하게 썼다. 이 책에서 다룬 항목들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편집자로 일한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가려 뽑은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론적 접근을 지양하고 평이한 예시를 통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_「머리말」에서
“국수 불기 전에 얼른 먹고, 김치 담구던 거 마저 담자.”
위의 문장을 언뜻 접했을 때, 크게 위화감을 느끼는 우리말 사용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특히 입말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들어 넘길 법한 문장일 수도 있다. 한글 파일에서는 ‘담구던’에 빨간 밑줄이 그어질 것이다. 우리말에 ‘담구다’라는 동사가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어쩌면 많을지도(‘담구다’는 ‘담그다’의 ‘방언’으로 일부 사전에 실려 있다). ‘담구다’라는 동사가 없으므로, 김치를 ‘담궈’ 먹었다거나, 김치를 ‘담궜더니’ 피곤하다거나 하는 문장들도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위에 예로 언급한 문장은 사실 (어쩌면 다들 아실지도 모르지만) 세 군데가 잘못 쓰였다. 바로 쓰면 이와 같다. “국수 붇기 전에 얼른 먹고, 김치 담그던 거 마저 담그자.”
이처럼 일상에서 입말로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입말로 그리 쓰므로 문장으로도 그렇게 쓰게 되는 경우도 물론 많다) 알고 보면 잘못된 우리말인 경우가 제법 있다. 그런가 하면, 입말(소리)로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막상 글로 쓰려고 하면 잘못 적게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데,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또 다른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다. “밥은 앉혀 놨고, 생선 졸여서 저녁 먹자.” 글이 아니라 소리로 나온 문장이라면 “밥은 안쳐 놨고, 생선 조려서 저녁 먹자”라고 발음이 되었을 테니, 올바른 우리말 문장이 된다. ‘앉히다’와 ‘안치다’, ‘졸이다’와 ‘조리다’처럼 발음이 같은 까닭에 혼용되어 잘못 쓰이는 단어 또한 우리말에는 적지 않다.
‘한 끗 차이’와 ‘한 끝 차이’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 ‘한 끗 차이’가 맞다. 의존 명사 ‘끗’은 “화투나 투전과 같은 노름 따위에서, 셈을 치는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노름 따위에서, 좋은 끗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는 ‘끗발’이라고 한다. 입말로는 익숙하지만 표기할 일이 거의 없어 ‘끗’이라는 글자 자체를 낯설게 느끼는 우리말 사용자가 적지 않은 듯싶다. _「끗/끝」에서
더욱 바른 우리말 사용자가 되기 위한 한 걸음
저자가 머리말에서 “우리말에는 그것을 바르게 표기하기 위한 합리적 규칙과 규정이 있”고, “말하기에서든 글쓰기에서든 그것들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적확하게 운용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리, 혹은 우리의 생각과 꼭 같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고 적었듯이, 우리말을 바로 쓰기란 실로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아무렇게나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실로 ‘때려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려치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장 정교한 사유는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고, 언어 표기법의 적확성은 그 사유의 밀도를 만드는 기본이”며, “헷갈릴 수 있는 말들의 표기를 바로잡는 것은 생각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을”(이광호 평론가)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만하지 않은 ‘규칙과 규정’을 지키며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과 틀린 말을 가릴 수 있고, 헷갈려서 잘못 쓰기 쉬운 말을 추릴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문장 감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계단을 밟”(장은수 평론가)을 수 있으며, 이 책은 우리가 그 첫 계단에 발을 디디는 데 친절하고도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본문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헷갈리는 말,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혼용되는 말, 비슷한 듯하지만 구별해서 써야 하는 말, 옳은 말-그른 말, 잘 띄고 잘 붙여야 하는 말, 품사가 다른 말, 다른 말에 붙는 말-활용하는 말 등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결은 같다. 우리가 평소에 ‘헷갈리거나 잘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말들’이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평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써 왔던 단어들이 ‘틀린 말’이거나 우리말에 아예 없는 말이라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또한 새삼 깨달으면서, 바른 우리말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을 것이다(흥미를 ‘돋구지는’ 못한다는 사실 또한 재차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