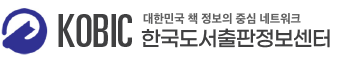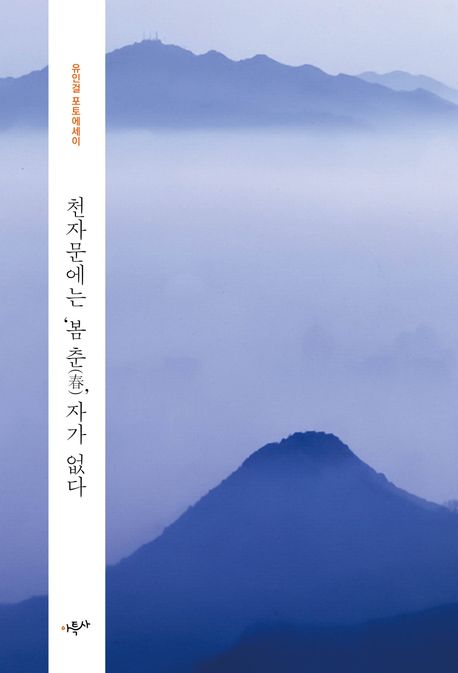전체 분야
도서분류
문학 > 테마에세이 > 포토에세이
문학 > 나라별 에세이 > 한국에세이
문학 > 나라별 에세이 > 한국에세이
도서소개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글과 사진
사진은 고독한 작업이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자발적 고독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포착한다. 사라질 순간을 잡아서 영원한 작품을 만든다. 그래서 사진은 인내의 예술이다. 근면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이슬처럼 사라질 것을 잡아내지 못한다.
이 책은 미수를 맞은 유인걸 성천문화재단 이사장의 포토에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엮은 것이다.
우선 사진이 너무 좋다. 목소리를 내는 사진들이다. 의미 부여된 사진만 바라봐도 시상이 마구 터져 나온다. 어떤 사진은 휴식이 되고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 어떤 사진과 글에는 인문학적 소양과 평생 독서를 통한 세상에 대한 성찰과 통찰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사진과 글이 재미있다. 유머가 있고 위트와 기지도 있다. 나이 듦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지극한 아내 사랑은 큰 감동을 준다. 이 시대 어른으로 쓴소리도 가감 없이 한다. 그런데 그 쓴소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통쾌하다.
글과 사진을 보면 저자가 얼마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온 분임을 알게 된다. 사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고 참다운 어른을 만나는 기쁨과 존경이 솟구친다.
추천사
주기중 (사진가)
“젊고 세련된 감성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편집해 보이지 않는 기운을 드러낸다. 맑고, 순수하며, 애정이 가득한 시선이다.”
안명옥 (시인)
“유인걸 님의 사진에세이집을 보면 잠들어있던 마음속 시심이 다시 돋아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누구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제자들에게 우선 선물하고 싶다.”
저자소개
저자 유인걸
(柳寅傑) 성천문화재단 이사장.
재단 설립자인 선친 류달영 박사의 뜻을 이어 인문학의 근간이 되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1937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고 농림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농심켈로그 주식회사 사장, 안성산업공단 초대 이사장, 한-덴마크 우유회사 사장을 역임했다.
목차
003 머리말
008 Part 1 사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
070 Part 2 여행, 깨달음의 고행
104 Part 3 예술은 내면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외부 현실을 짜 엮는 일이다
134 Part 4 천자문에는 ‘봄 춘(春)’ 자가 없다
174 Part 5 세월의 무게...
차곡차곡 쌓은 돌담에 하나씩 이가 빠진다
204 Part 6 내가 매일 책을 읽는 이유는 내 영혼을 풍부하게 하려 위함이다
224 Part 7 온고지신의 쓴소리, “라떼는 말이야.....”
262 Part 8 가족, 나의 힘 나의 버팀목
292 Gallery 덕산(德山)
312 추천사
318 작가의 생애
서평
‘눈-마음-손’ 으로 이어지는 창의적인 ‘포토아이’
사진은 ‘눈-마음-손’의 과정을 거친다. 그 출발은 뭔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선택적으로, 집중하며, 깊이 있게 대상을 관찰한다. 시각 뿐 아니라 오감을 동원해서 본다.
유인걸 작가는 독창적인 심미안을 가졌다.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사진을 보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무릎을 치며, 배시시 웃게 만드는 창의적인 ‘포토아이(photo-eye)’가 있다.
반가사유상이 전하는 ‘울림’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 십 차례 국립박물관을 찾고, 철불과 석불에 담긴 정신을 형상화하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구도의 길을 떠나듯 오지여행을 고집한다.
예리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때묻지 않은 순수를 카메라에 담는다. 예술은 자기를 찾고, 드러내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교감하는 마음이다.
꽃으로 만든 아내 방 〈꽃 커튼〉에는 반려자인 아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느껴진다. 호를 지어주고 무궁화를 연구한 아버님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진하게 느껴진다.
〈설국〉에서는 나이를 듦에 대한 실재를 솔직하게 얘기한다. 폭설에 발이 묶여 병원 갈 길이 막막한데 그 속에서 예술 하나를 건져 올린다. 무지개 사진은 느림의 미학이 느껴진다. 느리다는 것은 천천히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격호의 무덤〉과 〈노인은 없다〉 같은 사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노인성 난청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행지의 낯선 풍경이나 일상의 작은 사물 하나에서도 이야기와 역사와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대 어른으로 쓴소리도 가감 없이 한다. 그런데 그 쓴소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통쾌하다.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진과 글에 사람이 있다. 그의 사진에는 인문학적 소양과 독서를 통해 배어 나오는 문자향이 느껴진다. 피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젊고 세련된 감성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편집해 보이지 않는 기운을 드러낸다. 맑고, 순수하며, 애정이 가득한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