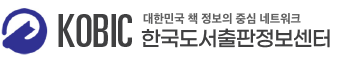전체 분야
도서분류
문학 > 한국시 > 현대시
도서소개
당신은 오늘 몇 편의 시를 읽었나요?
『구석을 보는 사람』은 당신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 년에 한 편의 시도 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깊은 밤 마주한 시의 한 구절에 마음이 붙들립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를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디 당신이 구석을 보는 사람, 알아채는 사람, 그리하여 이 시집을 발견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2020년 「숲의 잠상」으로 “자신만의 어법으로 어머니 대지의 숭고한 슬픔을 처연하게 노래하고 있다.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뿌리의 표정’까지도 살펴보는 화자의 시선이 믿음직했다.”는 평을 받으며 직지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김정숙. 첫 시집 『햇살은 물에 들기 전 무릎을 꿇는다』 이후 3년이 지나 두 번째 시집 『구석을 보는 사람』을 출간했습니다. 『햇살은 물에 들기 전 무릎을 꿇는다』에서 화려한 곳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물렀던 시인의 시선은 두 번째 시집에서 더욱 선명하게 깊어졌습니다.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총 6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의 구절에서 가져온 각 부의 제목은 ‘1부. 어머니의 시간이 시들고 있다’, ‘2부. 마음의 냄새’, ‘3부. 오래된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4부. 별안간 민들레꽃이 우리에게 온다’입니다. 늙은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시장 좌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자연물이 보여주는 풍경, 시 쓰는 마음, 끝내 희망을 찾아가는 태도…… 구석을 보는 마음으로 계속해 나가는 삶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김정숙
경북 김천 출생. 2020년 「숲의 잠상」으로 직지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첫 시집 『햇살은 물에 들기 전 무릎을 꿇는다』 이후 두 번째 시집이다.
햇살은 물에 들기 전 무릎을 꿇는다(양장본 Hardcover)
목차
시인의 말
1부. 어머니의 시간이 시들고 있다
엄마의 방
좌판의 코디네이터
병상일지
물방울 사진첩
이 가을, 그리움이 따뜻하다
꽃에도 그늘이 있다
광대노린재의 울음
물소리를 그리다
준설(浚渫)
눈길
달빛 탐색기
마디
바람의 손
냉이꽃의 집
수취거부
2부. 마음의 냄새
매듭론
층층나무 연대기
모래여인
배꼽
꽃병 값
타로점을 보다
동그라미를 믿다
고등어 뼈를 발라내며
오월의 창
치자꽃을 시연하다
자주달개비의 문
공허(空虛)
작아지는 햄스터
하현달과 흰여우
잿간
눈밭에 피는 망개 열매
3부. 오래된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손편지
자리에게 묻다
시계의 방
목어(目語)
변명
말이라는 물감
시숙(時熟)
딱지
하이퍼 詩, 당신
눈과 발
냄새
풀꽃의 노래
식물성 영혼
탈피
하늘 담은 강
말의 존재
박제
4부. 별안간 민들레꽃이 우리에게 온다
목도리
허브의 방
초록을 펼치다
나의 룰루
낙관불입
따듯한 침묵으로부터
살품
데칼코마니
끌
떨림, 그 파리한 빛깔
봄결
매화꽃의 귀
월대(月臺)
누설
손
합수(合水)는 합수(合手)다
추억 수선집
앵두
서평
“내가 시를 낳고 시가 나를 낳아, 삶도 시도 점점 나아갔으면 한다.”
볕이 들지 않는 구석을 향한 시인의 시선,
글자들을 어루만지는 마음…… 제법 애틋하고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관찰하고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의 눈길에선 곤충 ‘광대노린재’도 시가 됩니다. 다음은 「광대노린재의 울음」의 한 부분입니다. “겉모습을 추종하는 무리들,/ 기어가는 보석이란 별호가 영광이 아니라 형벌,/ 광대노린재가 노린 내를 뭉쳐/ 몸의 몽타주를 만들 때/ 아이들이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놀이를 할 때/ 햇빛도 광에 들기 전 무릎을 굽히듯이/ 울음을 꺾어 냄새로 눕힌다// 다들 키우지 못할 아이들을 왜 자꾸 만드는 걸까”.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준설(浚渫) 현장도 시인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모래 쌓이는 강가에 잡풀이 자란다/ 움푹 꺼진 물웅덩이는 할머니 잇몸처럼 허물어진다/ 당신을 만난 내 마음에도/ 쌓이다가/ 혹, 패인 자리 있었을까”(시 「준설(浚渫)」 1연) 하며 한 편의 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시인은 누구보다 글자들을 예민하게 매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순이 넘어 첫 시집을 출간했던 시인 김정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의 언어유희는 「달빛 탐색기」에서는 “달빛이 참빗처럼 어둠을 빗어 내린다” 하고, 「공허(空虛)」에서는 “허공이 공허하다/ 허공을 뒤집은 자리에서 자라는 투명 벌레/ 보이지 않으면서 나를 갉아먹는 동안/허허로운 눈빛으로 나를 염탐하며/ 안팎으로 살찐 허공이 캄캄하게 깊어진다” 표현합니다. ‘망개 열매’는 그의 시 속에서 “얼어 죽을, 망할 놈의, 개”가 아니라 “망망대해 헤엄쳐 온/ 부서지지 않을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눈밭에 피는 망개 열매」 참조).
때로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모래시계 안에서 흘러내리는 한 알의 여자는 「모래여인」이 되고, ‘시간을 익히다’는 뜻으로 시 「시숙(時熟)」이 탄생했습니다. 냉이꽃, 찔레꽃, 자주달개비, 잿간, 흙냄새, 애기똥풀꽃…… 자연물에 더불어 표면장력, 에테르, 신라시대 출토된 고양이의 뼈 등 새로운 소재까지 아우르면서, 시인의 상상은 고여 있지 않고 넓게 펼쳐집니다. “꽃나무의 무릎”, “유령처럼 웃는 바람”, “비명도 못 지르는 나무”, “젖은 흰 눈 냄새”, “담쟁이덩굴이 낡은 벽을 기어오른다/무형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붙들며”, “잘 익은 고등어 같은 저녁”…… 자신만의 표현으로 시인의 시가 무르익어 갑니다.
시를 읽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 이 책에는 제작자가 숨겨 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구석을 보는 사람’이 되어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 이 책의 편집자는 시인 김정숙의 딸입니다. 오랜 문학 편집자인 딸이 첫 시집에 이어 두 번째 시집도 편집했습니다.
- 이 책은 1인 출판사 ‘아무책방’에서 처음으로 출간하는 시집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소출판사 성장부문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