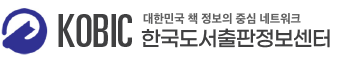전체 분야

도서분류
문학 > 한국소설 > 한국소설일반
도서소개
누군가에게 과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커다란 수족관이 되고야 만다.
그들은 끝내 바다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서로의 숨을 훔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소설 ‘수족관’은 보육 시설에서 자라난 인물 ‘류이치’가, 먼저 보육 시설에서 도망쳐나온 인물 ‘아카리’를 만나 겪게 되는 일들을 그려낸다.
이 두 인물은 자신들이 가진 뿌리 깊은 과거와 상처,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수족관에서 만나 입을 맞추고, 서로의 숨을 훔쳐가면서도 언젠가 오키나와의 너른 바다에 도착하는 꿈을 나눈다.
이 둘은 수족관을 벗어나 눈부신 햇살 아래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저자소개
저자 유래혁
글과 사진을 짓는다.
에세이 [당신과 아침에 싸우면 밤에는 입 맞출 겁니다.]
사진집 [What's your motto?] [What's your enemy?] 를 출간했다.
빛을 퍼트리기 위해 복제 가능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낸다.
목차
수족관 11
서평
아름다운 여름, 파도같이 몰아치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푹 젖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소설 ‘수족관’은 버려진 것들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아름답고도, 애달픈 이야기를 서정적인 문체와 장면이 손에 닿을 듯 선명한 문장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는 읽는 이로 하여금 그들이 서로를 훔쳐내던 2003년의 뜨거운 여름의 계절로 순식간에 몰입하게 한다. 책과 닿은 손끝에서 여름 특유의 축축한 촉감마저 느껴질 때쯤, 우리는 완전한 장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된다. 그중에서도 커다란 상실을 경험한 등장인물들이 그 공백을 극복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존재를 이용하게 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가슴 아프게 깨닫게 한다. 특히 이러한 버려진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외면해왔던 우리의 과거, 그 어두운 면면을 마주하는 데에 커다란 용기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설’수족관’은 등장인물들이 ‘수족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수족관’이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헤엄치며 갇혀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수족관에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게 하는 다정한 힘이 녹아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